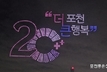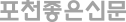내가 형님과 함께 식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지난 추석 때였다.
온 가족이 모인 날 형님은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온갖 추억들을 살려내어
옛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막냇동생과 함께 약속드렸다.
‘형님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지시면 모시고 고향에 가겠다’고.
마침 올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막내가
새 차를 샀기에 그 차로 모시겠다고 했다.
형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우며 3형제가 함께 가게 됐다고 좋아하셨다.
몇 해 전 12월 29일 저녁 9시,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 마당. 한겨울 밤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다. 그 시각 나는 맏형님과 손을 잡고 기념관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는 중이었다. 81세인 형님은 14살 아래인 내 손이 따뜻해서 좋다고 하셨다. 나도 형님의 온기를 꼭 잡은 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달 15일 그 형님이 귀향하셨다. 6·25전쟁 전 서울로 유학 온 후 군대 복무 3년, 해외 근무 4년을 제외하고 계속 서울에서 사셨던 분이다. 그런 형님이 이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향으로 완전히 귀향하셨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83세.
형님은 매우 건강하셨던 분이다. 그러나 80살을 넘기면서 급격히 쇠락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동년배 친구들보다는 상당히 건강하셨다. 물론 크고 작은 병치레를 자주 하긴 했지만 우리들은 100수를 하실 것이라고 여겼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게이트볼, 배드민턴을 즐기셨고 틈나는 대로 자전거도 타셨다.
그러시던 분이 지난해부터 무척 고향에 가고 싶어 하셨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조카들도 생업에 쫓기다보니 형님의 고향나들이는 뜻대로 되지 못했다. 나와 막내 동생도 형님을 모시고 고향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지내다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3월 형님은 갑자기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으셨다. 고혈압 부작용으로 생긴 ‘대동맥 비대 현상’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 일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형님은 그 큰 수술을 무난히 견디시고 이겨내셨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신 날 우리들은 마음껏 축하와 위로를 해드렸다. 그렇지만 수술하기 전보다는 거동이 훨씬 부자유스러웠다. 그즈음부터 형님은 전보다 훨씬 강하게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문제는 엄청나게 위험한 수술을 하셨던 분의 건강 상태였다. 겉으로야 별 이상 없지만, 승용차로 4시간 이상을 가시기엔 위험하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또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데다 소변을 제때 처리하지 못 하는 일도 잦아졌다. 수술후유증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형수님은 ‘더 건강해지면 고향에 함께 가자’며 달래시곤 했다. 동생인 나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곤 해 형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줄은 몰랐다. 형수님의 충고에 따라 형님은 혼신의 힘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해오셨다고 한다. 오르지 고향에 가보고 싶은 일념 때문이었다.
내가 형님과 함께 식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지난 추석 때였다. 온 가족이 모인 날 형님은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온갖 추억들을 살려내어 옛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막냇동생과 함께 약속드렸다. ‘형님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지시면 모시고 고향에 가겠다’고. 마침 올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한 막내가 새 차를 샀기에 그 차로 모시겠다고 했다. 형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우며 3형제가 함께 가게 됐다고 좋아하셨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헤어진 지 꼭 40일 만인 지난달 13일 형님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이틀 전 새벽녘 찾아온 뇌졸중에 쓰러져 말 한 마다 못하시고 떠나셨다. 큰 수술도 잘 넘기고 열심히 체력 길러 교향에 함께 가겠다던 분이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
형님은 그렇게 해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의 선산 부모님 곁에 누우셨다. 형님이 영원히 귀향하시던 날, 운구행렬 차안에서 나는 추석날 오전 그렇게 즐거워하셨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이별의 아픔을 삼켜야만 했다.
그리고 몇 해 전 그 추운 겨울밤에 잡았던 형님의 따스한 손길이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영원히 잡지 못하게 됐다.
대학 4년을 형님 집에서 지낸 나에게는 형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형님은 가난했던 집안의 장남으로 한 평생 고생만 하고 떠나셨다.
“형님과 함께 했던 지난 닐들은 행복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