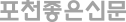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세한도’라는 작품명에는 ‘고난과 역경에도 변함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오래도록 푸르다는 것을 겨울이 온 뒤에야 알게 되는 법(歲寒然後知 松栢之後凋).”
논어 자한(子罕) 편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가 이르기를 “그 해의 추운 겨울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고 했다. 즉 사람들이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군자인지 소인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니, 급할 때라도 차근히 생각하고 처신을 하라는 교훈이 담겨있다.
그의 이 같은 가르침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혹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다움을 갖추면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전한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보고 "가장 추울 때도 너희들은 우뚝 서 있구나"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그림 세한도(歲寒圖)에 이 뜻을 담아 오늘날 그 가치를 높여준다.
추사 김정희는 19세기 조선 시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서예가이다. 50대 에 이르러 종2품 벼슬까지 오르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치적 풍랑에 휘말려 제주도 유배형에 처해진다.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양 온 김정희에게 사제 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두 차례나 북경으로부터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李尙迪)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유하며 답례로 그려 준 것이다.
당시 중국 땅에서 책을 구해오기란 무척 어려운 데다 중벌의 위험도 무릅써야 했을 것이다. 그의 인품을 날씨가 추워진 뒤에 제일 늦게 낙엽이 지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하여 그렸음을 밝혔다. 이 작품은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가로 69.2㎝, 세로 23㎝의 크기이다. 한 채의 집을 중심으로 좌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주위를 텅 빈 여백으로 처리하여 극도의 절제와 간소함을 보여준다.
그림 위에는 세한도라는 제목과 함께 또 다른 호(號)인 ‘완당(阮堂)’이라 적고 도장을 찍어 놓았다. 거칠고 메마른 붓질이지만 한 채의 집과 고목이 풍기는 스산한 분위기가 추운 겨울의 분위기를 맑고 청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극도의 절제 속에 풍기는 문인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조선 후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그림의 끝부분에는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작가의 발문이 화면 끝부분에 붙어 있으며, 이어서 이 그림을 받고 감격한 이상적의 글도 적혀있다. 이후 20명의 문인과 지식인들이 감상평을 남기며 15m에 달하는 대작이 됐고, 여러 주인을 거치며 숱한 고비도 넘겼다. 세한도는 이씨 문중에서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후 한 서예가의 노력으로 국내에 돌아오게 되었다.
세한도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손창근 선생은 이를 소중히 간직하다가 조건 없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2년 전 대를 이어 수집한 작품 304점을 내준 데 이어 마지막으로 소장하고 있던 '세한도'까지 기증한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구랍 8일, 손창근 선생에게 문화훈장 중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 했다.
"세한도가 코로나 때문에 지친 국민들께 매우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수묵화 ‘세한도’를 국가에 기부한 미술품 수집가 손창근(91) 옹과 아들 손성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내외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보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손창근 옹은 추사 김정희의 걸작 ‘세한도’를 포함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를 이미 국가에 기부한 바 있다.
‘세한도’라는 작품명에는 ‘고난과 역경에도 변함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