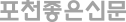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제 시를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 시집을 구해 읽으신 분들이 너무 좋은 시집이라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김순희 시인은 1953년생으로 올해 일흔하나 늦깎이 작가다. 최근 그는 '클림트의 겨울 숲에서'라는 예쁜 제목의 첫 시집을 냈다. 지난 5월 7일에는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도 조촐하게 가졌다. 그는 어려서부터 간직해 오던 꿈을 이렇게 늦게라도 이룬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요즘 주위 사람들에게 첫 시집 발간을 축하받을 때마다, 또 "시가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행복하다.
포천 호병골에서 태어나 영북 초·중·고를 다닌 토박이 포천 사람인 김 시인은 1980년 스물일곱 나이에 선생님이 됐다. 첫 부임지는 포천 외북초등학교였고, 그곳에서 4년 6개월 동안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그 뒤 의정부, 양주 등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했다.
김순희 시인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남달랐다. 영북초등학교, 영북중·고교에 다닐 때는 글짓기 대회라면 항상 맡아놓고 학교 대표로 출전해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었던 내노라하는 글 재주꾼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어서도 학교의 문예부 담당, 도서관 담당 등을 맡았고 교지 제작도 항상 그의 차지였다. 교육장님의 신년사와 송년사, 각종 연설문을 쓰는 것도 김 시인이 도맡았다.
김 시인은 2015년 만 35년 동안 교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다. 평소 그림과 음악을 좋아하던 그는 유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우클렐레나 오카리나 같은 악기 연주를 즐겼다. 그러다가 2022년 고모리 호수로 산책 중에 포천시문인협회 작가들이 둘레길 곳곳에 전시한 시 작품들을 구경하게 됐다. 그 가운데는 영북중학교 동창인 남궁종 포천시산림조합장의 시도 있었다. 그의 시를 읽고 불현듯 "나도 작품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곧 바로 포천시문인협회의 서영석 회장에게 전화를 했고 문예대학에 입학했다.
워낙 뛰어난 글솜씨를 가진 그는 바로 그해 2022년 '한국작가' 겨울호로 시 부문에 등단했고, 2023년 '한국작가' 가을호로 수필 부문에도 등단했다. 또 다음 해인 2024년에는 '스토리문학'에서도 수필 작가로 등단했다.
김 시인의 호는 혜송(慧松)이다. 지혜 혜자, 소나무 송자로, 항상 새로운 생각이 샘솟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었다. 자신의 호에 걸맞게 그는 거의 매일 시를 쓰고 수필을 써 내려갔다. 작가로 등단한 후 지금까지 20개월 정도 됐는데, 그가 쓴 시를 모아보니 무려 700편이 넘었다. 하루에 평균 한 편 이상 시를 써내려 갔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글로 남겼다.
그가 이 작품들을 골라 첫 시집을 내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700여 편의 시 가운데 이번 첫 시집에 발표한 시는 108편이다. 모두 자신의 생명처럼 애착이 가는 주옥같은 작품들로만 선정해 한 권의 시집을 완성했다.

시집의 제목이 된 그의 대표작 한 편을 감상해 본다.
클림트의 겨울 숲에서
미풍이 살랑대는 갈색 잎들이 햋빛에 부서질 때
클림트의 황금빛 나무들이 강렬하게 살아나는 걸 보았다
연둣빛 생명의 잎사귀와 초록빛 무성한 정글
오색 찬란한 단풍잎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햇살 따스한 12월의 숲
나무 아래로 떨어진 낙엽도
무수하게 매달린 나뭇잎도
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클림트의 계절 12월은
갈색 잎마다 황금빛을 입혀
세상 제일 비싼 그림을 완성한다
클림트의 숲속은 눈이 부시다
금돈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이 시에 나오는 클림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카소, 모네, 샤갈, 고흐 등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이고, 김순희 시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다. 그는 주로 노란색 계통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시는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라는 작품에서 착안해 쓴 시라고 한다. 김순희 시인은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의 한편에 서서 금돈처럼 반짝이는 눈부신 숲속을 보며 시를 향한 희망을 노래했을 것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고부터 막연히 가슴 한편에 시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사랑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여 더 많은 시의 바다에서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김순희 시인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리움의 원천은 결국 인생에 대한 물음이었고, 인생에 대한 나침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그리움의 근원을 따라 시를 배우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욕심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이때가 사십대 중반 나이였을 때였다. 두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뒤늦게 문학을 향한 향학열이 불타오른 것이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며 살아온 날들이 하나 둘 모여 소중한 첫 시집이 되었다는 김순희 시인.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한 송이 꽃으로 남을 시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정진하겠다"며 만년 소녀처럼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