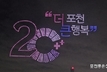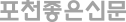설 명절 연휴에도 문을 연다고 하자 아는 사람이 큭큭 댔다. 명절날에도 문을 여는 책방이라니. 그는 아마도 조금 어이가 없었던 듯하다. 사실 책방을 시작하고 명절에 문을 닫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책방을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과 함께 있으니 사실은 특별히 문 닫을 일이 없다.
집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책방이 있는 1층과 살림집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나는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책방으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가방을 메고 퇴근한다. 중간에 내가 집에 올라가는 때는 점심시간뿐인 경우가 많다. 살림은 아침 출근 전이나 저녁 퇴근 후에 한다.
무엇보다 나에게 책방 문을 여닫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 나의 일상은 늘 같다. 명절이라고 해서 나의 일상이 깨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 모임도 불가능한 때는 더더욱 그렇다.
명절 아침에도 나는 1층 책방으로 내려와 커피와 빵,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하고, 화초에 물을 주고, 청소를 간단히 하고, 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책방이고 카페지만 이곳은 나의 소중한 작업실이기 때문이다. 작업실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대부분이다. 책방을 하면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읽고 싶은 책을 맘껏 읽는다는 것이어서 내 책상에는 봐야 할 책들이 항상 쌓여 있다.
온라인으로 시 필사 모임을 하는 요즘은 매일 시집을 들여다본다. 한 권의 시집에서 한 편의 시를 골라 블로그에 올리면 함께하는 이들이 그 시를 각각 필사, 단체 카톡방에 올려 공유한다. 짐작했던 대로 매일 일이라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지만, 매일 시를 고르는 즐거움이 꽤 크다.
책을 맘껏 읽고, 시를 필사하고, 작가와의 만남이나 콘서트를 열고. 언뜻 보면 책방을 하는 것은 마치 한가한 놀이처럼 보인다. 유한마담의 취미생활쯤으로 보고 이런 생활을 꿈꾸는 사람도 적잖다. 가끔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나이 들어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물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고, 그래서 책방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밖에서 볼 때는 물 위의 백조다.

책방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 목숨 걸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숨 건 듯 열심히 했다. 어쩌면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납품서류를 작성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공모기획서를 작성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가 섭외를 하고, 허리가 아프도록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매주 독서 모임과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고, 매월 말이면 정기구독 서비스인 북클럽 회원들에게 책을 보냈다.
본업인 출판일도 해야 했는데, 지난 한 해에는 내가 쓴 <시골책방입니다>, <살아갈수록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네요>와 여럿이 함께 쓴 <위드 코로나> 등 3권의 책을 냈다.
이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여건은 ‘책방’이라는 공간 때문이었다. 책방이 아니었다면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줄어든다. 책방을 차리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 책방이라서 할 수 있었던 일들. 책방은 내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줬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두 번째 산>에서 ‘당신이 일하는 환경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서서히 바꾸어 놓는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한다. 책방은 나를 서서히 바꾸고 있다. 책방을 하기 전에는 나만을 위했던 일들이, 책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누군가와 함께함으로써 함께 위하는 공간이 됐다.
독서 모임을 통해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람, 클래식 음악회를 통해 생활이 더욱 반짝거린다는 사람, 글쓰기를 통해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사람들. 이들과 만남은 내 삶을 더욱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책방과 함께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책방은 나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함께 꿈을 꾸는 장소가 됐다.
‘공간에 우리의 경험과 삶, 애착이 녹아들 때 그곳은 장소가 된다.’
인문지리학자 이 푸 투안이 <공간과 장소>에서 말한 것처럼 책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곳은 특정한 장소가 되었다.
지금의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책방. 어쩌면 지금 이곳은 가족을 제외한 나의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손때가 묻은 책과 음반이 있는 곳. 수십 년 묵은 이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책방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들이 자양분이 되어 새 책을 들여놓게 하고, 작가를 초대하게 하고, 콘서트를 열게 한다. 묵은 것들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것들은 이곳에서 묵혀짐으로써 이곳의 풍경으로 자리 잡는다.
큰 창 아래 햇살을 등지고 앉아 앞의 큰 창으로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본다. 같은 창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매일 낯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