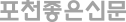비록 프로그램 비중이 경(輕)하다 해도
연 이어져 있는 세 프로(생활의 지혜, 오늘의 요리, 주부 뉴스)를
격일로 방송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이를 갖고 가타부타 불평할 시스템이 아니었기에 그대로 감수하는 밖에 없었다.
아침 방송이 늘었음에도 여성 PD를 뽑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디지털 세상이 열리면서 세상은 급격하게, 숨 가쁘게 변해왔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나 사회구조, 기계문명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초고속으로 바뀌고 있어 웬만큼 공부해서는 미처 따라가기도 어렵다. 참으로 억울한 것이 기존의 전통 사회를 살아온 7080세대이다. 디지털이 정착되면서 세상의 소통 수단이 달라진 것이다.
모든 기준이 인터넷으로 축약되고 수 없는 웹사이트들에 넘쳐나는 정보들 하며 이 때문에 까닭도 없이 시대의 뒤편에 밀려나, 인터넷도 제대로 못 하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무지 계층으로 치부되어야 하는 일이 어찌 억울하지 않은가.
혹여 컴퓨터를 쓰다 문제가 있는듯해서 손을 놓아야 한다거나,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의 활용이 쉽지 않아 닫아버리는 일을 7080세대는 다반사로 겪고 있다. 그때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 혹은 속속 알 수 없는 신제품 출시를 거듭하는 기계 문명의 발달이 두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 점점 더 뒤처지고, 그런대로 쫓다 보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플 때도 없지 않다. 그러니 억울할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여성에 대한 올드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여성에 대한 예우를 내놓고 차별한다거나 하대를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니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엄청 제고(提高)된 세상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기에 우대되는 경향마저 곳곳에 보인다.
우선 정부에서부터 여성의 사회적 품격, 혹은 활동 범위를 높이고 넓히느라 여성 장관을 비롯해 곳곳에 여성을 심어놓고 있다. 이른바 성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표명이다. 또 법조계는 물론, 각급 공무원, 과학계 등 과거에는 감히 넘보지 못했던 전문 분야에서도 여성들은 차등 없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시절은 어땠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비교적 두고 있지 않은 전문 직종이 바로 언론, 교육, 의료 분야였던 것 같다. 그런데 언론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차별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제때 진급(직책)이 어렵다거나 일의 차별을 둔다거나 하는 것은 항용 있는 일이었다.
TV의 모든 프로그램 제작은 PD 시스템이다. 흔히 말하는 프로듀서란 프로듀스(produce) 혹은 프로덕트(product)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기 십상인데, 텔레비전에서의 PD란 프로듀스(혹은 product)와 디렉팅(directing 혹은 direct)을 함께 맡는 사람이다. 오디오 제작으로 끝나는 라디오와 달리, 비디오 즉 화면 제작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에 동원되는 제작 인원이 오디오, 비디오, 조명, 카메라 무대미술 등 디렉팅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인원이 20여 명이 넘는다.
내가 일하던 60년대 후반(TBC‐TV 1964년 개국, 1965년 입사) 무렵은 TV에서의 여성 PD는 쓰려고 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한두 명 있는 정도였다. 디렉팅을 하는 것이 명령체계로 간주되어 20여 명 이상의 스태프를 현장에서 움직이는 디렉팅을 여성이 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암암리의 여성 비하 사고가 통용되고 있었다.
내가 KBS 라디오에서 TBC‐TV로 자리를 옮겼을 때 여성 PD는 단 한 명이 있었다. 그 뒤에 조봉남씨가 아나운서실에서 제작부 PD로 올라와 나까지 3명이 되었다. 이 시절엔 라디오에서도 여성 PD는 이남홍 여사 1명 뿐이었다.
그 무렵 김동국 사장에 이어 홍진기 씨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어 아침방송(이전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만 방송)이 시작되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방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 담당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났다. 매일 방송하는 10분짜리 주부 뉴스, 20분짜리 생활의 지혜, 오늘의 요리 등이 그것이었다. 프로그램 웨이트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대단히 경미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것을 나와 조봉남 씨 두 사람이 격일 방송으로 맡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방송이었다.
TV 방송의 제작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PD 시스템이라 아무리 적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게스트 섭외에서 시작하여 내용을 압축한 큐시트 작성, 비디오 자막 제작, 스튜디오 세트 설정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손이 가는 것은 흔히 골든 시간대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골든아워에는 드라마, 인기 쇼 프로가 점유했고, 물론 그것들은 모두 남성 PD들이 맡고 있었다. 또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AD(Asistant Directer)는 따로 두지 않았으나, 차후 PD를 꿈꾸는 외부인들이 PD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그런 프로그램 AD를 맡아 해주고 있었다.
실제로 AD를 맡았다가 기회가 생겨 PD로 승격된 이들이 꽤 있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이들 비공식 AD가 두세 사람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녹화 때 플로어 매니저까지 해주곤 했다.
TV프로 제작에서는 감독을 하는 주조(主調‐주조정실)와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플로어 매니저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다른 동료 PD들이 시간을 바꾸어 가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플로어 매니저를 해 준다. 디렉터(PD)에 따른 큐 사인을 플로어 매니저가 출연자들에게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큐 시트(진행표)에 따라 다음 준비를 시키는 것, 스튜디오 내의 소품 하나까지도 미리 점검하는 것 등은 모두 플로어매니저의 일이다.
당시는 녹화 도중 에러(NG)가 나면 중간 편집이 되지 않던 시절이라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야 하므로,특히 드라마 녹화에서는 연출자(PD)와 플로어 매니저, 연기자의 호흡은 초긴장 상태일 밖에 없다. 잘 녹화되던 50분 드라마의 끝부분에서 NG가 나서 처음부터 다시 녹화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 메인 스튜디오가 하나뿐으로 녹화 시간이 제한되고 뉴스(별도의 아나운스 부스에서 진행)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송출이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녹화든 생방 전에 끝내야 한다.
골든 시간대의 쇼 프로, 드라마 등 굵직한 프로 외에는 대부분이 녹화가 아닌 생방송이었다. 아침 방송은 모두 생방송인데, 생방송에서의 에러는 달리 손쓸 바도 없기 때문에 에러에 대한 부담감은 녹화 프로나 마찬가지로 매우 컸다. 눈에 띄는 실수인 경우는 가차 없는 시말서 감이다.
비록 프로그램 비중이 경(輕)하다 해도 연 이어져 있는 세 프로(생활의 지혜, 오늘의 요리, 주부 뉴스)를 격일로 방송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이를 갖고 가타부타 불평할 시스템이 아니었기에 그대로 감수하는 밖에 없었다. 아침 방송이 늘었음에도 여성 PD를 뽑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TV에서의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녁프로그램은 1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들이다. 매일 하는 것은 저녁 시간 시작 때 나가는 ‘이브닝쇼’가 있을 뿐인데 이 역시 생방송이다.
PD와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TV에서의 구조 기능에 대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 외에는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시 우스개 얘기 하나를 하자면 디자이너 강숙희 씨 귀국(미국에서 정통 패션 수학) 패션쇼가 당시 유네스코 회관 스카이라운지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맡게 되어 친구 몇 명을 초대했더니 쇼가 끝난 다음 그들은 나에게 ‘PD라면서 어째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가? PD 맞는가?’라는 놀림당한 일이 있었다. 있을 법한 얘기다.
오프닝 전에는 쇼 현장을 살피지만 쇼가 시작되면 외부에 있는 VTR 카 안에서 녹화를 했으니까 그들이 현장에서 대면하는 것은 2명의 플로어 매니저 뿐이니 PD의 노고를 알 리 있는가. 이런 난센스는 스튜디오 정규 프로그램 때도 자주 있는 일이다.
모든 부서의 일이 대부분은 그 담당하는 일의 경중(輕重)에 따라 사람의 값(?)이 함께 치부되는 경향이 은연중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들 일터의 풍속이다. 가령 빅쇼를 맡은 이는 그 빅쇼만큼의 웨이트를 갖게 된다. 신문의 편집국만 해도 무슨 부 기자를 하는가, 어느 출입처를 나가는가 등이 기자의 값을 운위하는 잣대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 학교, 관공서, 사기업체들, 아니 세상의 모든 일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한데 그 시절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야말로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런 마당에 디렉팅이 행사되는 TV에서 여성 PD를 기용하려 하겠는가. 그 때문에 여성 PD는 지극히 제한된 부처에 최소의 인원인 한두 명만을 배치해두고 꾸려가는 것이 현실이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여성 장관은 물론이려니와 사법부를 비롯해 모든 기업체, 혹은 굴지의 CEO까지 여성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격상된 것이다. 사회 인식이 크게 달라졌을 뿐 아니라 더러는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
이른바 몇 년 전부터 크게 이슈가 된 #Me Too 운동 역시, 그 근저는 여성 인식의 지향된 단면 표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어느 한편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가 높임도 낮춤도 아닌 정직한 평가의 잣대로 활용되는, 그런 세상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