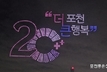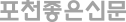그가 구름과 비행기, 신호등과 물탱크. 그가 그것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시간은 약 6년. 그동안 찍은 사진은 수천 장에 이른다.
그는 그중 일부를 골라 책을 내고 싶어 했다.
그는 가급적 많은 사진을 넣고 싶다고 했다. 1천여 장의 사진집.
그 많은 사진을 다 넣고 싶은 이유는 매일의 기록, 즉 일기이기 때문이다.
아는 친구가 책을 내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다. 사진기자 생활을 오래 한 그는 매일 일기를 쓰듯 사진을 찍었다. 그가 찍은 것은 구름과 비행기, 그리고 신호등과 물탱크였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걷다 구름이 있으면 핸드폰을 꺼냈고, 비행기 소리가 나면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구름을 찍기 시작한 것은 땅을 보고 걷는 것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매일 달랐다. 하늘의 표정은 구름으로 인해 변화무쌍했다. 구름은 단 한 번도 같은 표정을 한 적이 없다. 구름은 하늘의 특권이었다. 특히나 저녁 하늘은 그의 마음을 언제나 앗아갔다.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은 그를 어디에서나 멈추게 했다.
중학교 시절, 집에 갈 때마다 그는 쓸쓸하다고 느꼈다. 쓸쓸해서 하늘을 바라본 것인지, 저녁 하늘 때문에 쓸쓸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소년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저녁 하늘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종종 그에게서 벗어났다. 낯선 도시에서 그는 어른이 되었고, 밥벌이는 그 저녁 하늘을 잊게 했다. 보통의 삶처럼 하늘을 올려다볼 새 없이 살면서 젊음은 소진됐다.
하늘을 보기 시작한 중년의 어느 날. 그는 하늘을 찍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비행기를 찍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행기는 그가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열심히 하늘을 보다 운 좋게 비행기를 찍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귀를 기울였다. 길을 걷다 비행기 소리가 나면 휴대폰을 꺼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하늘길 아래 사는 그는 비행기 소리가 나면 얼른 베란다로 뛰어갔다. 비행기는 어느새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얼른 셔터를 눌렀다. 운이 좋으면 비행기가 정중앙에 크게 보였지만, 때로는 먼 곳에서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다. 그래서 어떤 사진은 그냥 빈 하늘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쉽게 틈을 주지 않았다.
그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 도시. 매일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특별시로 나가는 길에서 그는 두 가지를 발견한다. 하나는 신호등, 또 다른 하나는 물탱크.
신호등은 우리가 아는 신호등이다. 어느 저녁, 신호등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여름이었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신호등이 함께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 하늘과 구름 속에 놓인 신호등은 아름다웠다. 다음날, 그는 다시 신호등을 봤다. 역시 어제의 신호등이 아니었다. 빨간색과 노란색, 초록색은 매일 다른 풍경으로 있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물체인 신호등이 그에게는 매일 다른 말을 걸어왔다. 그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으로 신호등에 답을 했다. 같아도 다른 모습. 그와 신호등만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였다.
물탱크 역시 마찬가지다. 물탱크 역시 변하지 않는 물체다. 서울로 오가면서 매일 만나는 물탱크는 어렸을 때 고향 마을에 있던 물탱크를 닮아 있었다. 그는 물탱크를 보기 시작했다. 물탱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는 영역 밖에 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지나면서 먼발치에서 물탱크를 바라봤다. 짝사랑이었다. 그는 물탱크를 지날 때마다 셔터를 눌렀다. 차가 정차한 순간에는 똑바로 볼 수 있지만, 움직이는 순간에는 물탱크도 따라 흔들렸다. 물탱크가 버스 뒤로 밀려나면 그는 물탱크와 대화를 나누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매번 다른 표정으로 찍힌 물탱크가 그의 카메라 속에서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가 구름과 비행기, 신호등과 물탱크. 그가 그것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시간은 약 6년. 그동안 찍은 사진은 수천 장에 이른다. 그는 그중 일부를 골라 책을 내고 싶어 했다. 그는 가급적 많은 사진을 넣고 싶다고 했다. 1천여 장의 사진집. 그 많은 사진을 다 넣고 싶은 이유는 매일의 기록, 즉 일기이기 때문이다. 제작비가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에게 출판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책을 내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디자인과 제작, 편집 등 일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찮다. 특히나 사진집인 경우는 더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제작 과정을 듣고 나서 그는 아는 디자이너에게 편집을 부탁하고, 소량 인쇄를 하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하루 만에 연락이 왔다. 사진을 고르다 보니 사진도 좋지 않고, 해서 나중에 다시 기회를 봐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의 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다 다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의 일기를 훔쳐보고 싶었고, 이왕이면 좋은 편집으로 만나고 싶었던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진을 찍을 때의 생각을 글로 메모해두세요. 글이 있으면 나중에 책을 만들 때 좋으니까요.”
그와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이 한동안 머리에서 맴돌았다. 무엇보다 그가 찍은 사진의 소재들이었다. 그를 통해 하나의 대상으로 살아난 구름과 비행기, 신호등, 물탱크. 별것 아닌 것들이 그에게 왜 특별한 무엇이 됐을까. 그는 왜 그것들을 ‘발견’하고 ‘촬영’함으로써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것이 예술이 되는 지점은 얼마나 낯설게 하느냐에 있다. 나는 그의 ‘일기 사진’을 보고 예술적 가치를 논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대상을 바라본 그의 시선은 이미 일상을 넘어섰다.
볼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에 나만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을 보는가는 결국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이어진다. 그것이 곧 내가 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지? 그가 내게 던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