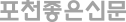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
"그래, 그대들이 아직 있어 주는 것이 나는 고맙고 고맙다". 이 생각이 가슴 벅차게 차오르면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지인에게 고맙고 고맙다는 생각을 잠깐 사이 뜨겁게 하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어때? 점심이나 같이할까?” 오늘 아침 댓바람에 친구 두 명에게 전화해서 느닷없는 콜을 했다. 아니 댓바람도 아니다. 전화를 한 것은 느닷없지만 점심을 같이하고 싶다는 생각이야 꽤 되었고 이차저차 시간을 비집어 한 것일 뿐이다.
동창이다. 특별히 가깝다기보다 비슷한 취향, 비슷한 식성이 공통한데 내가 얼마 전 선배로부터 대접받았던 음식(일식)이 맘에 들어 그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문득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기 그지없는 느낌이었다.
"그래, 그대들이 아직 있어 주는 것이 나는 고맙고 고맙다". 이 생각이 가슴 벅차게 차오르면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지인에게 고맙고 고맙다는 생각을 잠깐 사이 뜨겁게 하고 있었다.
60년대 중반쯤의 얘기인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유학 간다는 것은 웬만큼 해선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 그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나에게 한 번도 유학을 갈 것이란 얘기를 한 일이 없는데, 나는 그가 그럴 것이란 생각을 진즉부터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나는 내가 그것을 예견했던 것처럼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속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었다.
이제 그는 나와 같은 하늘 아래 없다는 것, 내가 바라보는 그 하늘을 그는 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마음 아팠다. 그가 떠난다는 사실 앞에 나는 오직 '같은 하늘' 아래 그가 없다는 것, 그것만이 너무나 크게 클로즈업되어 다른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만나고 헤어짐이 아주 안타깝고 절실할 수 있는 일이련만 나는 그때 왜 그다지도 '같은 하늘' 아래에 묶여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초쯤이었던 것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전에 만나던 이들은 대부분 직장 관계의 동료나 선‧후배, 혹은 사회로부터 엮인 지인들이었다면, 90년 들어서면서 그동안 격절하게 지내던 동창들로부터 러브콜이 있어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를 대여해서 전국 유명 사찰이나 명승지 곳곳을 탐방하곤 했다. 이름 하여 여학교 이니셜을 붙이어 'SM 산우리'라 했다. 나는 더러더러 시간이 맞으면 그들과 동행했는데 나름 옛 시절로 돌아간 듯 티 없는 시간이 신선하게 느껴졌었다.
친구도 그렇다. 나이 들면서 서로 기호도 맞고 대화도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눈높이, 엇비슷한 취향을 가져야 이야기도 쉽고, 공감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친구들이 나를 기억하기로는 조금 까달스런 면이 있었던 듯하다. 그것은 어린 날을 같이하던 때의 얘기이고, 나이 들어 그런 모서리가 다 깎이고 아주 편안한 마음가짐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 서기며 총무, 그리고 회장일까지 한때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나에 대한 껄끄러운 인식이 어느 만큼 불식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은 한두 가지를 빼고는 가능한 한 친구의 범위를 축소하려 애쓰고 있다. 시간의 안배도 어렵거니와 내실을 다질 까닭이 있다 싶기 때문이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은 더욱 즐거운 일이다. 또 함께 음악을 듣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함께하고 산행도 같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더욱 기꺼운 일 아닌가.
그러나 이보다 더더욱 크나큰 환희로움은 보고 싶은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중에 한두 번씩은 때 없이 떠올라 그립고 보고 싶은, 길을 가다가도 문득 떠오르고 차를 마시면서도 불현듯 떠오르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느닷없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
아주 가깝지는 않아도 불러내어 함께 시간을 같이할 수 있는 그대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싱겁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대들―. 마주 앉아 흘러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대들―. 푸른 하늘을 한가롭게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줄 아는 그대들―. 멀리 떠난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그대들―. 그대들이 있어 주는 것이 고맙고 고맙다. 그대들이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이 고맙고 고맙다.
지금도 그렇다. 그때처럼―. 내가 아는 모든 그대들이여. 진정코 그대들이 같은 하늘 아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 것인가를 그대들은 아는가. |
2025-04-11_FRI
2025-04-10_THU
2025-04-09_WED
- 포천교육 위해 포천시청소년재단과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손 잡다 17:41
- (사)대한한돈협회 포천지부, 가산면에 한돈 기탁 17:38
- 아트밸리번영회·갑을섬유, 화재 피해 섬유공장에 성금 전달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