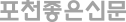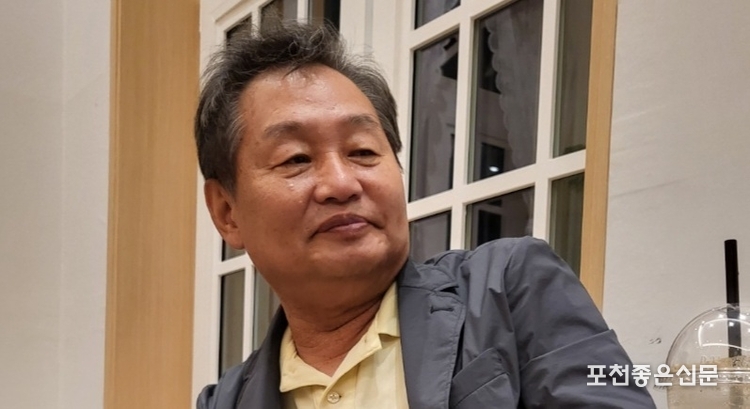
'에움길'과 '지름길', '뒤안길'과 '고샅(길)'. '논틀길'과 '푸서릿길', 좁고 호젓한 '오솔길'도 있다. 휘어진 '후밋길', 낮은 산비탈의 '자드락길', 돌이 많이 깔린 '돌서더릿길'이나 '돌너덜길', 사람의 자취가 거의 없는 '자욱길', 강가나 바닷가 벼랑의 '벼룻길', 그리고 낭만적인 '숫눈길’도 있다.
'길'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흔한 말이다. 이 ‘길’은 순수한 우리말이다. 우리 민족은 한자를 쓰기 전인 옛날부터 현재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길'이라고 말해왔다. 이 '길'이란 단어는 신라 향가에도 나온다. 그래서 '길'을 가리키는 말들은 대개 우리말이다.
그런데 길 이름에는 질러가거나 넓은 길보다 돌아가거나 좁고 험한 길에 붙은 이름이 훨씬 많다. 마치 우리네 인생사와 비슷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길'이라는 이 한 글자 단어를 좋아했다. 그 어감이 감칠맛 나게 입에 착 감긴다. 긴 세월 좋은 친구처럼 다정하게 긴 여운을 주는 단어다.
‘에움길.’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이도 있을 듯하다.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이라는 뜻이다. '둘레를 빙 둘러싼다’라는 동사 ‘에우다’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의 반대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은 질러가서 가까운 길이고, 에움길은 에둘러 가서 먼 길이다.
집 뒤편의 길은 '뒤안길'이고, 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고샅(길)'으로 불린다. 꼬불꼬불한 논두렁 위로 난 길은 '논틀길'이다. 거칠고 잡풀이 무성한 '푸서릿길'도 있고, 좁고 호젓한 '오솔길'도 있다. 휘어진 '후밋길', 낮은 산비탈 기슭에 난 '자드락길', 돌이 많이 깔린 '돌서더릿길'이나 '돌너덜길', 사람의 자취가 거의 없는 '자욱길', 강가나 바닷가 벼랑의 험한 길은 '벼룻길'이라고 불린다.
'숫눈길’도 있다. 눈이 소복이 내린 뒤 아직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사랑하는 임의 첫 발자국을 기다리는 낭만적인 길이다. 이처럼 ‘길’이란 단어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유적이다. ‘도로’나 ‘거리’가 주는 어감과는 완전히 다르다.
‘길’은 단순히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없다'라거나,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길은 '삶의 방법'이나 '삶, 그 자체'를 말할 때도 떠올리는 단어다.
영어 ‘way’도 ‘street’와는 달리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단어에서 인생을 연상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불교나 유교, 도교 등 동양 사상에서의 공통적 이념도 '도(道)'라고 부르는 '길'이다.
우리는 평생 길 위에 있다. 그 길에서 누군가는 헤매고, 누군가는 잘못된 길로 가고, 누구는 한 길을 묵묵히 간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고, 탄탄대로가 있으면 막다른 골목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똑같은 길은 없다. 오직 나만의 길만, 내가 걷는 길만 있을 뿐이다.
미국 가수 프랭크 시내트라는 명곡 'My Way'를 불렀다. 그는 "Yes, it was my way"라고 노래했고, "I did it my way"라고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또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명시 ‘가지 않은 길’에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라고 썼다.
길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떠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길을 간다’라는 말보다 ‘길을 떠난다’는 말은 왠지 낭만적이고 애잔하며 결연하다. 결국 우리는 길 위에서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길이 입신양명의 길이거나, 고행의 길이거나, 득도의 길이거나,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거나, 바이칼 호수의 자작나무 숲길이거나, 동네 둘레길이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네 인생이 곧 길이요, 우리의 발길이 삶이다. 결국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지름길을 택할 것인가, 에움길로 돌아서 갈 것인가. 인생길은 결국은 속도와 방향의 문제이다. 지름길로 가면 일찍 다다르겠지만 그만큼 삶에서 누락되고 생략되는 게 많을 것이요, 에움길로 가면 늦지만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꽃구경도 하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도 듣고, 동반자와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저마다 바른길, 즉 정도를 걷는다고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도무문이라고 했다. '바르고 큰길에는 문이 없다', 곧 정도로 가면 거슬릴 것이 없다는 말이다. 무엇이 정도인가. 기왕 시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자신의 영광보다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의 길을 가야 할 텐데,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