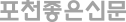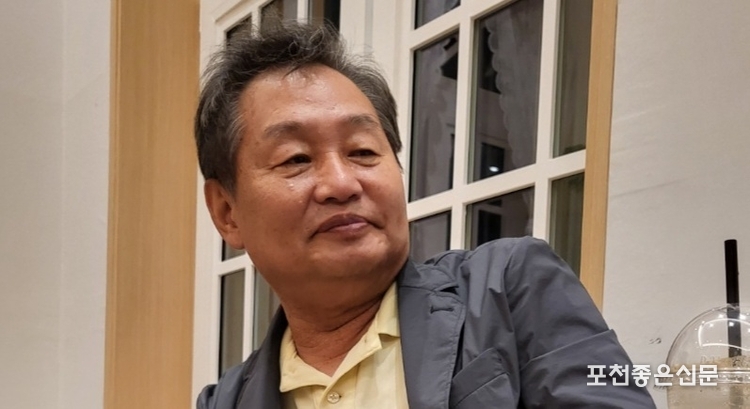
그 순간 어린 시절 돈암동 달동네의 그 좁은 비탈길에서 얼음을 지치던 모습이 떠오르고, 골롬반 수도원의 예쁜 성모님 얼굴이 생각났다. 갑자기 두 눈에서는 그동안 참았던 응어리 같은 슬픔이 복받쳐 오르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 하느님.......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난 골롬반 수도회의 그 커다랗고 파란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다. 이제는 더 이상 까치발을 떼지 않아도 인터폰을 누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수도원을 들어선 순간, 왠지 섬뜩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난 브라이언 신부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층계를 몇 계단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다. 층계 위까지 다 올라선 후 신부님 방에 들어가려는데, 전부터 낯이 익었던 신부님 한 분이 나를 불렀다. 크리스(Chris)라는 이름의 뉴질랜드에서 오신 젊은 신부님이었다. 나중에 크리스 신부님은 내 결혼식의 귀한 손님으로 초대되어 참석하기도 했다.
“타이, 놀라지 마세요. 브라이언 신부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는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는 브라이언 신부님과는 달리, 어설프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시다니…, 난 처음에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없었다. 어디 급히 외출하셨는가, 정도로만 알아들었다. '돌아가셨으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뒤늦게 그 말이 브라이언 신부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뜻이라는 걸 깨닫고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머리를 쇠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다.
신부님이 죽다니…,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내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신부님과의 3년 동안의 추억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지나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내 앞에 나타나신 신부님, 수도원의 그 커다란 파란 대문 앞에서 ‘하이’ 하며 내게 인사를 청하시던 신부님, 영국에서 왔다는 사탕과 과자를 내 주머니 속에 한 움큼씩 넣어주시던 신부님, 지구본을 돌리시면서 당신이 가보셨던 나라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던 신부님, 용돈과 학비를 주며 내 등을 토닥거리시던 신부님, 영화 구경이라도 하고 온 날, 그 장면을 영어로 설명해주면, 마치 자신이 보신 듯 신이 나 하셨던 신부님,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 파란 눈으로 내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시며 ‘비 굿(Be good)’이라고 하셔서 나를 혼동하게 하셨던 신부님.
나는 신부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신부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신부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는 신부님이기 이전에 자상한 내 어머니였으며, 참된 나의 스승이었다.
신문사에 입사하고 조금 후 결혼했다. 곧 아이가 태어났다. 스물여섯에 철모르고 낳은 아이는 아들이었다. 까닭 없이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난 것은 왜일까. 제 친할아버지가 경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안드레아라는 세례명도 받았다.
경석이가 다섯 살 때였던가. 어느 일요일,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아이가 경련을 시작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눈자위가 하얗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발작이었다. 괜찮으려니 했지만 아이는 이후에도 몇 번이나 똑같은 경련을 계속했다.
간질환, 소위 말하는 뇌전증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경석이의 그 작은 몸 구석구석에는 온갖 의료기구가 연결됐다, 정수리에는 대못 같은 링거도 꼽혔다. 놀란 아이는 자지러지며 울어댔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실감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기자 초년병 시절은 늘 바쁘고 정신이 없다. 초를 세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려병원(지금의 강북삼성병원)에 아이와 함께 있었다. 꼬박 이 년 동안이었다. 다행히 중앙일보가 있는 서소문과는 걸어서 반 시간 거리였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그러잖아도 가파른 고려병원을 오르내리는 비탈길은 몹시 미끄러웠다. 약을 타 가지고 병원을 나와 서둘러 취재현장으로 가기 위해 급히 내려오던 나는 갑자기 몸이 기우뚱거리며 눈 위로 미끄러졌다. 무릎이 깨어지고, 입술은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한 일을 아이의 약 봉투를 찾는 일이었다. 아이의 약이 들은 봉투는 하얀 눈 속에 사방팔방으로 점점이 흩어져 떨어졌다. 하얀 약, 빨간 약, 파란 약..., 추위에 얼어서 곱은 손을 불어가며 한 알이라도 빠트릴세라 조심스럽게 약을 집어 들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돈암동 달동네의 그 좁은 비탈길에서 얼음을 지치던 모습이 떠오르고, 골롬반 수도원의 예쁜 성모님 얼굴이 생각났다. 갑자기 두 눈에서는 그동안 참았던 응어리 같은 슬픔이 복받쳐 오르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 하느님.......
경석 안드레아는 그 후로는 건강하게 자랐다. 가끔 고뿔은 걸렸지만, 제 부모를 걱정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2013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성당에서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내 곁을 떠났다.
지구본을 돌리며 자신이 가본 나라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주던 브라이언 신부님을 닮았는지, 아들은 어려서부터 유학을 떠나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지금까지 40여 개국을 돌면서 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중동 두바이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현재는 한국 S그룹 J기획 법인장으로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산다. 아들의 아들과 그 아들의 엄마와 함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