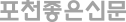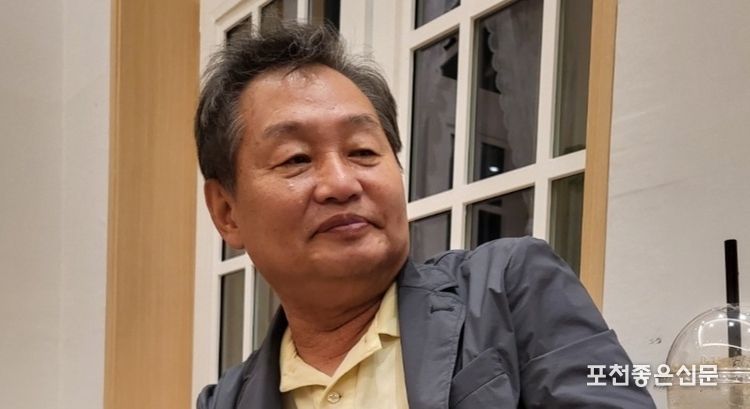
지금도 50여 년 전과 다름없이 돈암동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골롬반 수도원. 가난한 달동네 소년은 그 수도원의 커다란 파란 대문을 들어서면 마치 레테의 강을 건넌 듯 이상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 시원하게 펼쳐진 마당에 들어선 순간,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소년에게는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서울 성북구 미아리고개가 있는 돈암동 달동네에서 살았다. 지금은 재개발 바람을 타고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 숲으로 모습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지경이지만, 당시 돈암초등학교 주변은 내 손바닥 눈금을 들여다보듯이 훤한 곳이었다.
겨울날 눈이라도 내리면 그 좁은 달동네 비탈길은 미끄러운 눈썰매장이 되곤 했다. 동네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은 그러잖아도 미끄러운 길을 걸어다니지도 못 하게 한다고 얼음지치기를 못 하게 했다. 연탄 부지깽이까지 들고나와 말리고는 했지만, 별다른 놀잇거리가 없었던 내 또래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탈길이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썰매 타기 놀이를 즐겼다. 그것도 지치면 하얀 연탄재를 가루처럼 깨서 눈 위에 뿌려놓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인심 좋은 할머니라도 만나면 고쟁이 속에 꼬깃꼬깃 숨겨놓은 쌈짓돈을 얻어서 그 길로 만화가게로 직행했다.
연탄가스로 어머니를 잃은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2남 2녀 중 막내였던 나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이곳 돈암동으로 이사왔고, 할머니 손에 길러졌다.
돈암동 사거리에서 아리랑 고개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들어서면 입구 모퉁이에 짙은 녹색으로 깨끗하게 칠해진 큰 대문 집이 있었다. 달동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대문이 있는 집으로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대문 집'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곳은 외국에서 온 가톨릭 신부님들이 거주하는 골롬반 회관이었다. 그때부터 오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 건물은 돈암동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건물인 듯한데, 어쨌든 이곳은 나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한 장소로 오래도록 기억되는 곳이다.
"하이."
어느 날 골롬반 회관 주변을 걷던 나는 깜짝 놀랐다. 머리가 하얗고 코가 큰 외국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영어라면 조금은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때였지만 막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니, 그 쉬운 대답을 한마디 못 하고 얼굴이 빨개진 채 쩔쩔매고 있었다. 손짓 발짓을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내가 대견스럽게 보였는지 그는 그 커다란 문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브라이언(O. Brien)이라는 이름의 이 신부님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골롬반 수도회 회관은 달동네에서 살던 소년에게는 꿈의 궁전이었고, 그 커다란 파란 대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나는 매일이다시피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 까치발로 그 커다란 대문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다.
"Who is it?" (누구세요?)
지금은 일반 아파트에도 대부분은 설치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영어 질문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나는 긴장했다. "This is Tai speaking. I wanna to see Father O. Brien." (타이입니다. 브라이언 신부님을 뵈러 왔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외웠던 영어를 속사포처럼 내뱉으면, 잠시 뒤에 찰칵하고 문이 열렸다.
그제야 소년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단 몇 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라도 문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초조함에 안절부절했던 것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레테의 강을 건넌 듯 이상스러울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 달동네 소년은 시원하게 펼쳐진 마당에 들어선 순간,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마당 한 구석에는 성모님 상이 있었고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 마리아상의 얼굴이 참 예뻤다는 기억이 있다. 마리아상 옆에는 자그만 돌층계가 있었는데, 아마 열두 계단이나 되었을까, 그리로 올라가면 왼쪽에 나무 덩굴로 뒤덮인 단층짜리 건물이 나타나고, 그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 돌면 첫 번째 방이 브라이언 신부님의 방이었다.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면 "Come in" (들어오세요)하는 반가운 듯 높은 톤의 브라이언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환한 웃음에 두 팔을 활짝 벌려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신부님이 그곳에 계셨다. 침대가 있는 조그만 방 하나와 그리고 그 방과 바로 연결된 거실에는 오래된 옷장과 책장, 그리고 책상과 탁자가 놓여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서너 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방은 소년의 꿈을 상상의 나래로 이끌기에 충분한 곳이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