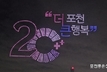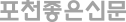다른 사람들은 어떤 대화들을 나눌까.
남편과 내가 하는 대화란 고작 시사 토크가 전부다.
그는 언제나 그의 관심이 쏠려있는 시사 문제 외엔 내게 특별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나는 그것도 반갑고 고마워
열심히 경청하면서 응대한다.
그것도 안 한다면 그는 온종일 누구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사람에 따라서는 본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
말수가 많은 사람을 흔히 다변한 달변가라 한다면 말수가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눌변(訥辯)이라 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으나 나는 어느 편인가 하면 후자에 가까운 편이다. 재미있게 말할 줄도 모르거니와 평소 많은 말을 하지 않는 달까, 꺼린 달까, 아무튼 좋게 말하면 말을 절약한다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화제에 인색하여 자칫 어리숙하다는 얘기도 들을 만하다.
그런데 남편 역시 아주 말이 적은 편이어서 우리는 살면서 그닥 많은 말을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젊어서는 서로 바쁜 탓도 있었겠지만 노년에 들어서는 바쁜 것도 아니면서 서로 말이 별로 없으니 아주 재미없는 커플인 셈이다. 그럼에도 부부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동작 하나 손끝 발끝 움직임으로도 모두 통하고 알 수 있다. 느끼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그렇다. 대인 관계, 친구 관계, 혈육 관계, 연인 관계에서도 일일이 말을 하고 설명을 해야만 아는 것은 아닌 성싶다.
나는 이런 것들을 물리학이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 선호하는 것, 증오하는 것, 소망하는, 신뢰하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동시성으로 나타나는 것, 굳이 그것을 확인해보지 않아도 상대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는 것, 나는 이를 물리학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생각이나 느낌, 그 어떤 것들이 그들과 나의 공간에 떠 있어 그 어느 시간에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리하여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혐오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끼는 것 아닌가.
“참 날씨 좋구만... 시간이 너무 빠르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몰라.”
“ 그러게요. 젊을 땐 왜 그거 몰랐을까. 나일 먹고 우리도 노인이 된다는 거, 생각이 안되더라구요.”
“그때는 사는 데만 바빴고 너무 열중해서 그랬나.”
“참 허망하지요. 고작 이렇게 살고 이렇게 늙어갈 뿐인 것을 그렇게도 애쓰고 애달아했는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
남편과 나의 대화다. 또 이런 것은 어떨까.
“우리가 함께 여행이라도 한 일이 있던가?”
“아니,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 데리고 휴가 때마다 대천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같은 데 갔던 거. 참, 왜 경주에 현대호텔 지었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거 알아요?”
“그게 끝이라고? 왜지?”
“그다음…?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이 녀석들이 안가겠다고 해서…”
“오래된 얘기군… 그러니까 당신과는 함께 여행 한번 못한 셈이군. 그렇지? 원 세상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도 한번 같이 타봤으면 좋았으련만”
“…...”
“참 볼품없네. 왜 그랬을까.”
남편은 혼자 소리로 끝을 맺는다.
나는 안다. 그 시절엔 해외여행이 허용되지도 않았었다. 내가 미국을 처음 갔던 것도 81년인가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세계 여기자 작가 대회 때가 처음이었다. 남편은 중국(중국은 80년 무렵까지는 출입 불가국이었음)을 필두로 유럽, 남미 등 여러 나라를 일 때문에 꽤 나갔었다.
나는 지금 남편의 심사를 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다. 아마도 함께하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런 날들이 이제는 어렵다는 걸 미안쩍어하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대화들은 팩트가 아니다. 내가 꾸민 픽션이다.
남편과 대화를 하면 어떤 말들을 할까, 생각해보았다. 막상 별다른, 혹은 색다른 얘깃거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궁색한 대로 그저 위의 얘기 비슷한 정도가 아닌가 싶어 옮겨본 픽션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대화들을 나눌까.
남편과 내가 하는 대화란 고작 시사 토크가 전부다. 그는 언제나 그의 관심이 쏠려있는 시사 문제 외엔 내게 특별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나는 그것도 반갑고 고마워 열심히 경청하면서 응대한다. 그것도 안 한다면 그는 온종일 누구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위에서 나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름 찾느라고 공통의 대사를 떠올려 보았지만 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차라리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것들인지,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혹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등, 그런 것들에 대해 신랄한 대화가 이어진다면 어땠을까. 무슨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내가 가장 이야기를 즐겁게 많이 했던 것은 방송국을 다니던 때였던 것 같다. 그 시절은 물론 젊었던 탓(20대)도 있겠지만 가까이 죽이 맞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도 같다. 8층 영화부에 있던 민벙숙이란 친구였는데 공통 관심사가 있었달까, 가끔 시간을 내어 영화 한편을 같이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대한 비평과, 배우에 대한 비평, 감독에 대한 비평으로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찻집과 음식점을 번갈아 가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나누었었다.
감독으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앨프레드 히치콕, 엘리아 카잔(초원의 빛, 에덴의 동쪽), 배우는 제임스 딘, 스티브 매퀸, 클린트 이스트우드, 로버트 레드포드, 폴 뉴먼, 찰스 브론슨, 워런 비티, 알랭 들롱, 라이언 오닐, 존 웨인 등―에덴의 동쪽, 태양은 가득히, 리스본 특급, 스팅, 러브 스토리,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초원의 빛, 더러는 서부극들까지 우리들의 얘기는 끝이 없었고 대화는 영화 얘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림 혹은 음악, 혹은 인물평 등 기호가 같거나 다르거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화제에 올리곤 했다.
대화를 한 것이다. 모름지기 대화란 얘깃거리가 있어야 하고 의견 개진(開陳)이 필수 되는 것이다. 위에 든 인물들은 당시 우리들 화제에 자주 오른 이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떠올려보니 그들 모두가 당대를 풍미한 영화인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모두 그 화려했던 생을 마감한 이들이다.
소통(疏通)은 의사를 전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만 대화(對話)란 그 오고 가는 말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의 다음 단계를 대화라 할 수도 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보통의 부부들은 진정 어떤 대화들을 나눌까. 부부가 함께한 시간 속에 쌓아둔 추억을 꺼내어 대화하는가, 아니면 각각의 젊은 시절 지나왔던 옛이야기를 나누며 대화하는가, 아니 우리들 곁을 훌쩍 떠난 아이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가. 아니 오늘의 세상살이에 대해 가타부타하는가. 아니 그 어떤 것인들 무슨 상관있으랴, 소통이 아닌 대화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기억 속에 퇴적하여 삶의 역정(歷程)을 만들고 그 궤적(軌跡)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은 내가 수발하는 것에 대해 더러더러 말한다.
“고마워.”
나는 그때마다 왠지 눈물겹다.
이것은 바로 소통의 힘이다. 그 한마디 말에 깔고 있는 수 없는 말들은 함께 살아온 숱한 감정들을 포개고 포갠 것들임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때로는 한마디의 소통이 대화를 압도하는 압권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