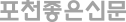예전의 늦가을 농촌 풍습-고사
이른 봄부터 땀 흘리고 애태우며 키워낸 농작물을 거둬들인 농부들은 마치 기말시험을 끝내고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학생처럼 가벼운 심신으로 사랑방에서 만나 그동안의 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논밭 언저리와 집 주위를 둘러보며 한 해 농사를 뒤돌아보고 정리한다. 그래도 가을 일이 모두 끝난 건 아니다. 추수 뒷정리와 겨울 준비가 남아있다.
특히 농촌 아낙들이 할 일은 아직도 지천이다. 음력 시월에는 집안의 여러 신께 수확에 감사하는 고사(告祀)를 지내야 한다. 고사는 집안의 성주, 터주, 제석, 삼신, 조왕 등의 가신(家神)에게 집안 안녕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의례이다. 시골에서는 보통 추수가 끝나고 좋은 날을 정해 그 예를 올린다.
먼저 집안의 신을 모신 성주 항아리와 안방 제석항아리에 햅쌀을 갈아 넣고, 뒤꼍의 터줏가리 나락을 바꾸고 집을 새로 짓는다. 그리고 떡을 놓고 고사를 지낸다. 쌀가루, 찹쌀, 수수, 무 등을 켜켜이 올리고 맨 위에는 반드시 붉은 팥을 뿌린 시루떡과 작은 시루에 쪄낸 백설기 등을 고사떡으로 쓴다.
붉은 팥을 쓰는 이유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이다. 떡을 한 조각씩 그릇에 담아 부엌의 조왕, 외양간, 대문의 수문장, 우물의 용왕 등 집안 신이 있는 곳에 모두 올린다. 떡과 함께 막걸리를 부어 놓고 집안의 안주인이 풍년에 감사하고, 집안이 무고하고 재수가 있기 등을 기원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떡 사발을 골고루 돌려 집안의 안녕을 함께 축원하고, 조상에 감사하는 정을 나눈다.
고사는 ‘고수레’라는 전통 민속 의례와 어원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고수레는 오래된 우리 민간신앙 행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외에 나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씩 떼어 산과 들에 던지면서 '고수레'를 외치고 소원을 빈다. 무당이 푸닥거리할 때 음식을 귀신에게 바치면서 고수레를 외치고, 몽골 사람들도 초원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수레하는 것을 보면 고수레는 신에 대한 제례 행사로 생각된다.
달리 생각하면 고사나 고수레 음식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어려운 이웃이나 짐승, 새, 곤충 등이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내려주신 하늘에 대하여 음식을 바쳐 감사하고, 어려운 이들과 미물 등에도 정을 베푸는 살가운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속정 깊은 까치밥과 이삭
농촌에서는 가을걷이할 때도 어려운 이웃이나 짐승, 새 등을 생각했다. 벼, 콩, 배추, 무 등 곡식이나 채소를 수확할 때 이삭까지 모조리 거두지 않았다. 또 감, 사과, 대추, 밤 등 과일과 열매를 추수할 때 가지 끝에 이삭을 남겨두었다. 감나무의 경우 이 이삭을 까치밥이라고 한다. 넉넉지 않은 생활임에도 농촌 사람들은 대대로 동물 등 미물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였다. 그들의 속정과 마음 씀씀이, 인심을 ‘이삭, 까치밥, 고사, 고수레’ 등에서 새록새록 느낄 수 있다. 관련한 필자의 시를 소개한다.
까치밥
아이야 모른다고
앞뒤 뜨락 나무 몇 알 남은 감 대추 배 장대로 따지 마라
쓸데없이 산딸나무 돌배나무 열매일랑 흔들어 따지 마라
산촌마을 함박눈 밤새 내리고 활짝 갠 다음 날 아침
소복이 눈 쌓인 까치밥 개울 옆 산딸나무 붉은 열매에
살포시 산새 내려와 완성되는
겨울 영상 감동의 파노라마를 아는가?
무덤덤한 무채색의 우리 산골 사람
진국 같은 까치밥의 속내를......
(저자 지음)
예전에 내 고향 포천에서 기르던 유실수라고 해야 대추나무, 밤나무, 배나무, 잣나무 등이 모두였다. 그럼에도 조상들은 나무에 까치밥을 조금씩 남겨두었다. 들판에서 벼, 콩 등 곡물을 추수하거나 배추, 무 등 채소를 거둘 때 어려운 살림에도 조금씩은 남겼다. 지금과 비교해 훨씬 어렵게 살았음에도 깊고 넉넉했던 조상들의 속정과 마음 씀씀이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도 다른 이의 것까지 탐내는 오늘의 이기적인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매섭다.
늦가을 막핀꽃을 보며 민초를 생각하다
10월이 얼추 지나가는 어느 늦가을날이다. 산책로 옆 비탈진 산기슭, 노루 꼬리만큼 볕이 비취는 길가 양지에 진달래 몇 그루가 소복하게 서 있고, 가을이 짙어가는 잎새 사이로 제철 아닌 두견화 몇 송이가 오들오들 몸을 떨며 피어있다. 늦가을에 개화한 막핀꽃, 두견화-사연이 있어 보인다. 돌에 쪼그려 걸터앉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제철 아니게 꽃 피우는 사연이 더욱 궁금해지며 안쓰럽다.
이리 피어난 진달래 막핀꽃도 애잔하지만, 더욱 가슴이 짠한 건 무수히 밟히고 밟혀 두터워진 발자국 모양의 흙더미를 헤집고 어렵사리 올라와 핀 민들레 막핀꽃이다. 둘 다 사랑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경제 규모로 보아서는 세계의 상위권에 드는 풍요로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막핀꽃과 같은 삶을 사는 민초들과 그들의 사연이 생각난다.
필자가 여의도 방송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9월에만 해도 온갖 꽃나무와 녹음의 나무들, 행락객으로 현란하던 여의도 공원이 11월이 되자 옷을 훌훌 벗고 혹한의 겨울로 향한 칩거 준비를 시작하자, 그 많던 비둘기, 까치 등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대신 남루한 배낭을 멘 노숙자가 양지 볕이 괜찮은 날, 벤치에서 추운 몸을 녹이고 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자마자 국회의사당역 출구 옆 시멘트 바닥에는 천막을 치고 노숙하며 농성하는 단체 들이 줄을 이어 자리를 잡는다. 노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와 하소연하고 외치는 민생의 마음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과 사회와 정치와 나라가, 가뜩이나 추웠던 그해 여의도의 겨울을 춥게 했다.
밤이 되자 대한민국 여의도 금융 월가(Wall 街)에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빌딩 숲의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공원 화장실에는 혹독한 겨울 추위를 피하려 온몸을 화장지로 둘둘 감싸고 쪽잠을 청하는 무기력한 노숙인 - 민생이 있다. 그 옆에는 우리 경제의 상징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과 국제금융센터 빌딩이 여의도의 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늦가을 차디찬 날씨에 제철 아니게 피어나는 진달래, 민들레 막핀꽃의 아픈 모습을 보자니 이십여 년 전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의 겨울을 더욱 춥게 했던 그 시대의 민초들과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는 민초들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막핀꽃
시월의 늦가을 양지 볕에 피어나는 두견화야
무슨 사연이기에 낙엽 사이 황혼이 머물다 간 저녁에
꽃피우나 외로이 찬바람에 떨고 있는 막핀꽃
무얼 그려 피우나 쓸쓸히
홀로 앉은 나와 마주한 너
서녘 하늘 아래 땅거미 밀려오고
가로등 불 밝히면
편하디편한 오래된 친구 추억이란 놈에게 건네는 한잔 술과
……
창밖에 막핀꽃 피고 잎은 지는데
무심한 가을날 아름다운 추억 나들이
(필자의 시)
길가에는 보라 하양의 들국화와 쑥부쟁이꽃이 고즈넉이 피어있다. 가을이 깊어지니 대추나무는 이파리가 모두 떨어지고 빨간 대추 몇 알만이 가을바람 찬바람에 몸을 떨고 있다. 조금 남아있던 은행잎이 간밤에 내린 가을비로 황톳길에 흩뿌려져 걷는 이의 걸음을 추적이게 한다. 이제 뒷산의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단풍나무도 옷을 훌훌 벗고 나신으로 겨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산마루 밑 조막 밭의 이삭 없는 수숫대와 논바닥의 용도 없는 허수아비가 겨울 문턱 시골 풍경을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서재원 교수
. 창수초등학교, 포천중, 포천일고, 서울대 졸업
. 한국방송 KBS 편성국장, 편성센터장(편성책임자)
. 차의과학대학교 교양교육원장, 부총장
. 포천중.일고 총동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