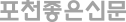같은 꽃과 풀도 볼 때마다 달라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내게는 남다른 즐거움이 하나 있다. 더군다나 그 즐거움엔 건강도 뒤따른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아닌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물론 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쓰는 말이라 이 비유가 적당하지 않음은 안다. 그래도 나는 코로나가 몰고 온 크나큰 어려움을 탈출하는 심정으로 나만의 그 즐거움을 좇는다.
한동안 따스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옷깃을 세우고 아침 운동을 나섰다. 햇살이 채 퍼지지 않은 이른 시각이라 차갑게 보이는 새파란 하늘엔 흰 구름 한 조각이 외롭게 떠 있다. 그야말로 찬바람에 밀려 곧 흔적 없이 사라질 뜬구름이다.
12월 중순 아침의 뜬구름을 보니 공연히 마음이 허전해진다. 올 한해는 물론이고 지나 온 날들에도 뜬구름처럼 살아 온 내 삶에 대한 회환 때문이리라. 앞으로 올 날들도 또 그렇게 흘려보낼까 걱정이 앞선다. 그런 생각에 잠겨 걷는 동산 길에 뜻밖의 예쁜 임들이 추위를 잊은 채 나를 반겨준다. 서리까지 내린 쌀쌀한 초겨울 추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무리 지어 피어난 꽃들이다.
우리 동네에는 야트막한 동산들이 연이어 있다. 그중 한 동산에 상당히 넓은 장미원이 있다. 여러 종류의 각종 장미들이 초여름부터 만발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색깔도 다양하다. 그런데 초겨울인 지금까지도 새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 샛노란 장미 몇 송이가 예쁘게 피어있다. 그리고 그 근처 다른 길가엔 잎이 다 떨어진 개나리 가지들 가운데서 한 가지에 나란히 개나리꽃들이 피어 있었다.

또 다른 길의 길섶 시멘트 구조물 곁에는 ‘애기똥풀’의 연약하고 노란 꽃봉오리들도 보였다. 6월이 제철인 장미인데 아직도 제철인 양 새파란 잎과 함께 피었다. 개나리는 비 오는 날 싸리나무 잎에 매달리는 빗방울들처럼 나란히 달렸다. 애기똥풀 꽃봉오리들은 구조물 사이로 비치는 한 가닥 햇살에 언 몸을 녹이는 듯 느껴졌다.
물론 이 꽃들은 닥쳐올 동장군에 쫓겨 곧 생명을 다할 것이다. 찬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피어난 이 꽃들이 더 예쁘게 보이는 건 이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일까? 어떤 힘이 이 가냘픈 생명들로 하여금 찬 바람 몰아치는 겨울에 맞설 수 있게 했을까? 꽃들이 계절을 잊은 건지, 아니면 요즘 기온이 꽃 피기에 알맞았던 건지 아리송하다. 그 연약한 생명체들의 말 못 할 경이로움 앞에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나더러도 험한 세파를 가르며 굳세고 강하게 살라는 것 같았다.
내가 사는 동네는 한강에서 가깝다. 게다가 야트막하고 전망 좋은 동산들이 높낮이를 반복하며 남산까지 이어진다. 숲이 무성하고 걷고 달리기에 좋은 널찍한 공원도 있다. 산책로도 잘 정비돼 있어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이 동산의 길들을 다니며 운동을 한다.

어느 날은 솟아오르는 아침 해의 붉은 꼬리가 한강에 길게 드리운 모습을 본다. 또 어느 때는 짙은 안개에 싸인 서울 신구 도심과 그 너머의 북한산, 도봉산, 그리고 강남의 청계산, 관악산과도 무언의 얘기를 나눈다. 아내도 이 길들을 좋아한다. 우리는 수시로 이 산길로 트레킹에 나선다.
어느 때는 버스로 장충체육관까지 가서 그 뒤쪽으로 지나가는 한양도성을 따라 신라호텔~반얀트리 호텔~국립극장~남산봉수대까지 걷기도 한다. 어느 길이든 나무들이 울창한 데다 지대가 높아 조망도 좋다. 남산봉수대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 풍경과 그 외곽의 산들 또한 일경이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남산 북측순환도로는 우리 부부의 단골 산책로다. 이 길들에서 나만의 즐거움들을 찾는다.
즐거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광풍에도 불구하고 이 길들의 올가을 단풍은 변함없이 화려했다. 그 단풍이 어느 날 몰아친 한파에 밀려 화려했던 빛을 잃고 겨울 속으로 사라졌다. 단풍잎들은 추위에 떠는 땅과 풀밭 위로 떨어져 내려 이불처럼 덮어 주었다. 더러는 붉게, 더러는 노랗게. 이 단풍잎들에서도 나는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느낀다. 이 또한 날마다 아침 운동 하는 나를 즐겁게 해주던 빛이고 색상들이었다.
그 잎들에도 따사로웠던 봄날의 추억이 있을 것이고, 뜨거운 여름날 찾아든 매미들과 함께 노래 불렀던 즐거운 추억도 있을 것이다. 또 살랑살랑 불어와 한여름의 태양에 달구어진 서울의 열기를 식혀주던 시원한 가을바람과 나누었던 사연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낙엽들은 그 모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뒤로 한 채 미련이나 아쉬움도 안 남긴 채 떠났다.

마침 온 나라는 커다란 권력을 두고 다투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빚어내는 소음들로 난리다. 거기엔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온갖 추악함도 뒤섞여 있다. 그들은 언제쯤이면 분수를 알아 찬란한 빛을 남기고 스러져가는 낙엽처럼 스스로 사라질까?
이처럼 우리 동네 동산의 자락에서 피고 자라는 꽃과 나무들과 나누는 교감이 나의 즐거움이다. 매일 걷는 길가의 수목이고 화초들이지만 볼 때마다 달라진다. 철 따라 달라지는 풍광도 좋다. 혼자서도 즐겁지만, 아내와 함께 가면 더 즐겁다. 이 길엔 무서운 코로나 걱정도 없다. 파랗게 흐르는 한강 물의 찰랑거림도 느껴지고 서울 주변의 산들이 부르는 손짓도 보인다. 그 길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모습에서는 권력을 향한 인간들이 내뿜는 잡음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제 오후엔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바꾸어 놓았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즐거움이 있는 길! 나는 이 동산 길을 내일도 걸으련다. 올해엔 이 길에서 어떤 즐거움들이 나를 기다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