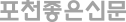필자 안훈.
존재감.
무릇 사람은 누구나 존재감으로 살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무얼 하는 사람인가.
인간의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역사를 만들어온 수 없는 걸출한 인물들도 밝히고 보면
결국 그 자신의 존재감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고
그것이 하나의 실록으로 인류의 대역사를 만들어 온 것 아닌가.
아들에게는 딸이 둘이 있다. 올해 9세, 6세 된 어여쁜 아이들이다. 늦게 결혼하여 3년 터울 딸을 둘 두었으니 아들의 기꺼움이야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큰손녀에 대한 사랑이 막강하다 보니 둘째가 태어났을 때 큰손녀 아이가 혹여라도 사랑이 나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걱정돼 그 애 앞에서 작은애를 예뻐라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다.
그런데 그 작은애가 두 살 되면서부터 설 때만 잠깐씩 와서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시로 자신의 존재감을 똑 부러지게 인식시키는 것 아닌가. '나도 있다', 혹은 '나 있다'라는 식의 무언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내외는 열심히 그 아이의 존재감을 은밀하게 인정해주곤 했다.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 30년이다. 그 30년의 가족 관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기만 했겠는가.
나의 친정어머님은 살림에 문외한인 딸을 배려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가사도우미를 설득, 나의 결혼과 더불어 내 집 가사를 돕도록 해 주시었다. 내가 가사에 미숙한 까닭에 혹여라도 시어머님이 가사를 맡게 되는 볼썽없는 일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시어머님은 이화여전 자수과 출신이다. 또 친정어머니는 경성사범(현 서울 사범대) 출신이다. 교육을 충분히 받은 분들이란 얘기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의 기본은 갖추신 분들이란 뜻이다.

고부 관계에 있어 시모의 높은 학력이 때로는 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살 때 바로 담 하나 사이 둔 이웃집이 시인 강민 씨 집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가족 구성이어서 아주 가까이 지낸 일이 있었다.
그 댁 어른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분이었다. 그분은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대체로 수수 무탈한 분이었다. 우리의 경우는 손자 손녀의 육아, 교육 문제에선 서로 의견이 엇갈려 더러 부딪히곤 했다.
여의도와 강남에 살 때 두 번 다 모두 1층이었는데 나의 시어머님은 라인 28세대의 E 여대 출신 주부들의 선배분으로 깍듯이 대접 받았다. 이른바 교분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신 것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나는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라 해도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처지였다.)
존재감.
무릇 사람은 누구나 존재감으로 살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무얼 하는 사람인가.
인간의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역사를 만들어온 수 없는 걸출한 인물들도 밝히고 보면 결국 그 자신의 존재감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고 그것이 하나의 실록으로 인류의 대역사를 만들어 온 것 아닌가.
인간의 욕구가 다양한 만큼 그 존재감의 결과물 또한 복잡, 미묘하여 오늘날의 굉대(宏大)한 문명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할 때, 존재감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만일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개인을 인정하는 이름을 주지 않고 무명(無名)으로 살게 했다면, 오늘날에 이르는 인류 역사가 과연 이루어졌을지 되짚어볼 만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의 점지(?)로 세상에 뚝 떨어진 그 날부터 어린 날은 누구의 자녀라는 존재감으로, 그다음은 그 자신이 무얼 하는 사람인가로,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존재감을 껴안고 씨름하며 눈을 감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아닌가.
존재감. 인간이 가진 이 존재감이 막강한 역사를 만들고 위대한 예술문화를 탄생케 하고 막강한 과학을 도출, 오늘의 4차 산업, 혹은 5G 시대를 끌어낸 것 아닌지? 까닭에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만만치 않게 일어난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첩첩이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갈등의 근저에는 바로 이 존재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도 볼 수 있다.
크게는 국가와 국가 관계, 사회와 사회, 가정과 가정, 개인 대 개인에 이르는 모든 관계 속에서 빈발하는 수 없는 갈등들. 그것들은 결국 존재감의 갈등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 원초적 질문에 부대끼고 시달리는 것 아닌가. 아주 어린 날, 초등학교 2년 때부터인가 나는 문득 이 질문이 떠올라 괴롭기 시작했다. 한밤에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있노라면 끊임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었다.
존재감. 그때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명제는 언제나 존재감의 문제였다. 학교를 다니던 때는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공부를 잘하면 되는 것으로, PD, 그리고 기자로 한창 열나게 뛸 때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채웠다.
또 가정에서는 누구누구의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 존재감이 부각되었지만, 그것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완벽 하고자 하면 할수록 부실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절실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몫을 해내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고 ‘나’만 동그마니 남은 때로부터 ‘나’의 존재감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것이 있다. 1980년대 소설 ‘베스트 10’에 꼽히었던 이 소설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외과 의사 토마시, 그를 사랑하는 여종업원 출신의 테레사, 화가 사비나와 그녀의 애인 프란츠 등 4명의 남녀가 격동기의 프라하를 배경으로 펼치는 사랑과 삶을 통해 인간 존재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한다.
삶의 무게와 획일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철학적 담론을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분법적 조명으로 추구한 이 작품이 최근 다시 떠오른 것은 아마도 제목에서 던지는 메시지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최근 들어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의 존재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설령 내게 주어진, 혹은 부과된 삶을 열심히 살았다 한들 지금 그것들은 모두 비산되어 흔적하고 있지 않다. 밀란 쿤테라는 외과 의사 토마시가 다시는 메스를 쥘 수 없는 정도로 손가락이 굳어버린, 막다른 곳에 이르러 ‘그런데 어디로 가지’로 시련의 끝을 보인다.
지금 나는 수 없이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했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