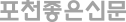예컨대 나는 모든 이름의 바람을 사랑한다.
한겨울 머리 위에서 잉잉 울어대는 바람, 어두운 들녘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바림, 바람 떼―.
늦가을 제주에서 만난 호곡(號哭) 같은 바람, 겨울의 문턱에서 마른 갈대숲을 울리던 을숙도의 바람,
바람은 어쩌면 나의 고향인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나의 고향, 잃어버린 나의 언어, 잃어버린 나의 시간.
나는 봄 몸살 같은 3월의 바람을 사랑한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지각(地殼)이 미처 눈을 비비며 깨어나기도 전에 보리밭 이랑에서 성급하게 피어나는 바람,
그 바람은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오한처럼 떨게 한다.
어느 때는 수줍고 어느 때는 미소 같고 어느 때는 마냥 속살을 간질이는 봄 몸살 같은 바람.
그래, 봄 몸살이다.
바위처럼 꿈적 않는 미욱한 사내를 어여쁜 교태로 흔들어 깨우는 몸살 같은 바람, 열여섯 살 소녀의 새빠진 웃음처럼 캬들캬들한 바람, 마디마디 움츠러든 겨울나무 가지에 새움을 눈 티우는 신비의 바람, 늪처럼 가라앉은 어둡고 긴 우리들의 침묵을 일으켜 세우는 바람.
그것은 3월의 바람이다. 여울물처럼 맑은 3월의 바람이다.
눈을 들어 사위를 둘러보라.
마침내 봄은 당도하느니 지난겨울의 시린 애환을 어찌 털어버리지 않으랴.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3월의 바람 끝에 솜사탕 같은 햇살이 넘실댄다.
이제 3월의 바람은 애틋한 숨결을 감추고 한밤의 냉기를 몰아내려 한다.
팔을 벌려 포옹해 보라.
풋풋한 봄의 향기를,
그것은 나부끼는 3월의 바람에 실리어온다.
나는 싱그러운 5월의 바람을 좋아한다.
아카시아 꽃내음이 은은히 풍기는 서늘한 눈매의 청년 같은 5월의 바람을 좋아한다.
잎들은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그 푸른 잎들 사이로 출렁이며 다가서는 젊음의 바람, 설레임 속에 만나고 설레임 속에 헤어지는 젊은 연인 같은 5월의 바람.
그래, 5월의 바람 속에서 사랑했었지.
순아, 그리운 순아,
너는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아직도 크고 작은 근심들로 망설이며 주저하며 멈칫거림인가.
5월의 동산에 올라보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빗살처럼 꽂혀오는 바람은 이제 풍요의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의 빛나는 열망을 라일락 가지 끝에 매달아 보렴.
처음으로 축복은 우리들의 것이다.
처음으로 생명의 충일(充溢)은 우리들의 것이다.
보아라, 저 바람을,
금빛 날개를 달고 깃발처럼 펄럭이는 5월의 바람을.
대지는 사랑으로 충만하다. 새들은 깃을 치며 노래하고 꽃들은 난만하게 어우러져 피고 있다.
누가 이 바람을 멈추게 하랴.
상쾌한 파문을 일으키며 홍소처럼 다가오는 눈부신 바람,
5월의 바람은 우리들의 이마를 뜨겁게 하고 있다.
나는 한여름 바닷가 해풍을 좋아한다.
해묵은 오욕을 씻어내듯 길길이 성난 파도에 밀리어 성큼성큼 몰아붙이는 씩씩한 바람, 햇빛을 부서뜨리며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달려와 시원한 손길을 내미는 푸르고 단단한 바람.
한줄기 해풍이 아닌들 찌는 듯한 폭양의 바닷가는 얼마나 무더우랴.
망망한 바다, 푸른 수평선, 불타는 모래톱, 원색이 난무하는 해변의 축제―.
여름 바다를 생각할 때 바닷바람을 빼놓을 수 없으리라.
바닷바람은 나에게 하나의 위안이 되고 있다. 엿가락처럼 늘어붙는 일상의 권태를 말끔히 씻어주는 그지없는 위안,
그렇다. 위안이다.
태양은 정오에 머물러 있다. 가슴이 뛴다.
가슴의 문을 열고 몸과 마음에 치쌓인 도회의 잡담을 씻어내는 시퍼런 몸짓의 바람,
긴 세월의 곤욕과 수치와 분노를 잊게 하는 바람,
포만에 들떠있는 우리들의 정염과 뜨겁게 달아오른 욕망을 식혀주는 바람,
끈끈한 미련과 사무치는 원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바람,
7월의 바닷바람, 아니 8월의 바닷바람은 그처럼도 늠름한 바람이다.
그 바람은 우리에게 일러준다. 묵은 때를 벗듯 속박의 옷을 훨훨 벗어 던질 것을.
그리고 바람은 말해준다. 우리들의 나날이 환상의 물굽이인 것을.
7월의 바닷바람 아니 8월의 힘찬 바닷바람이 우리들의 목덜미를 적시고 있다.
나는 쓸쓸한 가을바람을 그리워한다.
시름에 찬 옷자락을 끄을며 가을의 적막을 데불고 오는 시월의 바람, 아쉬움을 남기고 슬픔을 남기고 표표히 돌아서는 비정의 바람.
가을바람은 편편이 나부끼는 병든 나뭇잎에 묻어서 온다.
이제 젊음의 시절은 떠나버렸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상한 세월의 수레바퀴 밑에서 울먹이며 다가오는 바람의 아픈 신음소리를 나는 듣고 있다.
남달리 고달팠던 지난 시간, 남달리 뼈에 사무치던 신산(辛酸)을 다스릴 처방을 잊은 채 바람의 흐느낌을 나는 듣고 있다.
느닷없이 떠난 사랑, 미련 없이 가버린 사람을 그리며 울고 있는 바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나는 듣고 있다.
아아, 우리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던가.
나의 실수는 무엇이었던가.
밤새워 지난날의 과오를 되짚어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끝없는 회오와 속죄의 눈물을 흘린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태만이 부끄럽고 우리들의 불충이 진정 후회스럽거늘 지난날의 영화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날의 복락은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안일했던 삶의 터전은 가시방석입니다.
돌이켜 생각건대 나의 오만은 겸허를 모르는 소치였으며 나의 독선은 시련을 외면한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나의 미망(迷妄)은 어떻게 용서를 바랄 것인가.
몸속 깊이 파고드는 측량할 길 없는 바람의 집적(集積).
아아, 나는 바람의 크기만 한 나의 고독과 만난다. 바람의 크기만 한 나의 절망과 만난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이며 어느 때인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주 서야 한다.
지금이 그 시간임을 나는 안다.
그러나 아직은 결별이라 말하지 말자. 10월의 길목에 성성이 피어나는 적요의 바람, 서성대며 머뭇대며 회상의 무거운 짐수레를 끄을며 오는 그 바람을 나는 그리워한다.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바람,
절망과 절망이 만나는 바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바람,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바람,
슬픔과 슬픔이 만나는 바람,
10월의 바람은 그런 바람이다.
어느 때 문득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만남의 바람,
10월의 바람은 그런 바람이다.
머릿속을 울리며 지나가는 시린 바람,
10월의 바람은 그런 바람이다.
예컨대 나는 모든 이름의 바람을 사랑한다.
한겨울 머리 위에서 잉잉 울어대는 바람, 어두운 들녘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바림, 바람 떼―.
늦가을 제주에서 만난 호곡(號哭) 같은 바람, 겨울의 문턱에서 마른 갈대숲을 울리던 을숙도의 바람,
바람은 어쩌면 나의 고향인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나의 고향, 잃어버린 나의 언어, 잃어버린 나의 시간,
바람을 만나러 강변으로 간다. 바람을 만나러 벌판으로 간다. 바람을 만나 바람의 손이 되고 바람의 눈이 되어 바람과 함께 살며 바람의 바람이 되고 싶다.
그리운 이름, 바람이여,
허공중에 우뚝 솟았다가 소침(銷沈)하는 빛나는 바람이여,
아 나의 고독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