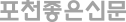나는 책방을 차리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책방을 차리길 백만 번 잘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책방 주인들이 아마 나와 같을 것이다. 이유는 큰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책방 하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은 바로 ‘책’과 ‘사람’에서 나오는데, 그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것이다. 이 즐거움을 책방을 찾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오래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텅 빈 책방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대뜸 책방 사용에 대해 문의했다. 그 질문은 책방을 최소한 한 곳 이상 다녀온 사람이나 가능한 것.
“큰 책장에 꽂힌 책은 그냥 보셔도 되고, 그 외 진열된 책들은 새 책이므로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책이 낡아지면 판매를 할 수 없어서요.”
우리는 카페를 겸하고 있어 음료도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그랬더니 그는 혹시나 몰라 먹을 걸 싸 왔다고 했다. 아마도 시골책방이라 하니 먹을 것이 마땅찮겠다 싶었던 모양이다.
그는 차 한 잔을 시키고 책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가끔 책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 싶어 가만있다 찰칵찰칵 소리가 계속 나서 망설이다 결국 다가가 말했다.
“저, 죄송하지만 책방 분위기 사진은 찍으셔도 되지만 책 한 권씩 찍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대뜸 말했다.
“제가 이쪽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죠?”
이쪽 일, 그러니까 작은 책방을 하는 사람이거나 할 사람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다.

“책은 어디나 있는 책이긴 한데요. 저희 같은 작은 책방의 책들은 책방주인들이 한 권씩 찾아서 주문한 책들이거든요. 선생님은 그럴 리 없겠지만 가끔 책 사진만 찍어서 인터넷 주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책방은 책을 팔아야 먹고 살잖아요.”
아, 이런 말까지 하다니, 내가 구차스러웠다. 유일한 손님에게.
나는 마침 전화가 걸려와 밖으로 나가 통화를 한참 하다 들어왔더니 손님이 가고 없었다. 아마 그도 그닥 기분은 좋지 않았을 터이다.
이것도 ‘장사’이다 보니 누구에게나 웃으며 친절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아주 가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오늘처럼 책 사진을 열심히 찍고 책은 한 권도 사지 않는 사람들. 한번은 부부가 함께 와서 부인은 사진을 찍고 남편은 액셀로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책방을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떤 책을 갖다 놓을지는 본인이 결정해야지 굳이 이런 시골책방까지 와서 책 목록을 작성하다니.
두 번째, 큰 서가에 꽂힌 책은 내가 갖고 있던 책들이어서 그냥 봐도 되는 책들인데 이 책들을 여러 권 빼서 쌓아놓고 읽는 사람들. 아니, 여기가 무슨 도서관인가? 그리고 무슨 참고도서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책을 쌓아놓고 본담. 한번은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음료를 딱 한 잔만 시키고 그림책을 열 권 남짓 쌓아놓고 아이에게 읽어 주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글로 써놓고 보니 그다지 큰일도 아니다 싶다. 사실, 책 한 권 사는 것이나 안 사는 것이나 뭐 그리 대수인가. 책 사진 좀 찍으면 어떤가. 책을 좀 읽는 사람이니 인터넷에서 사든 다른 서점에서 사든 책을 사서 보면 되지.
책을 쌓아놓고 보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서관처럼 좀 이용하면 어때? 어차피 다른 손님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책도 이미 낡은 책들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골책방까지 차를 타고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이 아닌가.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 갑자기 오늘 찾아온 손님에게 미안하다.
불특정 대상으로 뭔가를 판매하는 이들은 흔히 말한다. 별의별 사람 다 겪는다고. 책방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겪는 건 아니다. 책방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그 좋은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을 두고 특히 시골책방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밥 한 끼 해결하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조금 욕심을 내면 시골책방까지 왔으니 차도 한 잔 마시고, 책도 한 권 사는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 꼭 우리 책방이 아니어도 전국의 서점, 특히 작은 책방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곳에서 맘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작은 책방을 찾아가는 일이 관광지를 찾아가는 일도 아닌데 인증샷만 찍고 간다거나, 보고 싶은 책 사진만 찍고 간다면 그의 마음에 남을 것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리고 책방에서는 새 책을 ‘읽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지만 작은 서점들은 새 책을 맘껏 읽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새 책이 낡아지면 판매할 수 없어서 온전히 책방 몫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안내 문구를 써놓기도 하고, 누군가 새 책을 보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사정을 말하곤 한다. 지금은 곧잘 하지만 처음에는 그 말도 하지 못해 쩔쩔매곤 했었다. 아마 지금도 작은 책방 주인들은 누군가 새 책을 보다 엎어놓으면 가슴이 철렁할 것이다.
무엇보다 책방은 책을 팔아야 ‘먹고 사는’ 곳이다. 책방마다 서로 형편이 다르겠지만, 책방 해서 먹고살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걸 구매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작은 책방과 서점이 있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책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책은 상품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다.
나는 책방을 차리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책방을 차리길 백만 번 잘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책방 주인들이 아마 나와 같을 것이다. 이유는 큰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책방 하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은 바로 ‘책’과 ‘사람’에서 나오는데, 그건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것이다. 이 즐거움을 책방을 찾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오래 누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