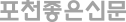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필자 김은성 작가.
론강변을 따라서(Cote du Rhone)
아비뇽의 북쪽에는 론강이 흐른다. 론강변의 포도밭과 알프스산맥과 론강이 펼치는 프로방스의 자연경관을 보라고 가이드북이 엮어준 코스를 따라서 돌아보는 여정을 따라가 본다.
와인에 심취해 있진 않으나 여행 떠나기 전에 맛보고 아주 맘에 들었던, Chateauneuf du papes(교황의 새 샤또)에서 온 와인이 생각나서 우선 그곳으로 가본다. 아비뇽 유수 70년도 안 되는데 교황청이 소유했던 포도밭이 바다같이 넓다. 농지 가운데 높이 솟은 언덕 위에 여름 궁전을 지은 교황청의 유적이 있어서 교황의 새 샤또, 샤토네프뒤팝(Chateauneuf du papes)이라는 이름의 마을이다.

▲교황의 여름 궁전에서 보이는 마을과 포도밭.
여기서부터 종일 자동차로 달려도 내내 끝 모를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 여기저기 와이너리 구경하다가 호텔에서 맛볼 와인 한 병만 샀다. 미국으로 보내면 송료가 병당 20유로라길래.
우리가 미국에서 마시는 와인이 20불도 안 되는구먼. 송료 생각하니, 미국산 와인이 가성비가 더 좋을 거라는 계산을! 하게 된다. 와인의 가격은 너무나 정직하여, 모든 이가 공감하진 않으나 값이 품질과 정확하게 비례한다고들 말한다.

▲귀여운 소년이 자신의 이름을 딴 와인이라고 하기에 한 병 사 들고, Respect its peace라고 써놓은 마을 입구에서 인증샷. 평화로운 마을 쉬제트( Suzette).
오늘 여정은 와이너리 투어(winery tour)를 빼도 프로방스의 자연과 경작지 위에 자리한 산 정상에 마을을 이루고 1,000년 세월의 흔적에서 계속 사는 풍경, 그리고 미스트랄(mistral)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프로방스의 바람으로 넘치게 아름다웠다.
샤또네프를 지나서 가이드북에서 학습한 내용을 숙제하듯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 오랑지(Orange)에 들러본다. 이곳에 잘 보존되어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고대 극장에서는 아직도 7, 8월에 세계 수준의 공연이 계속된다.
정명훈의 포스터도 있다. 2천 년 된 음향시설이 아직도 많은 음악인을 부르고, 원래 무대의 원형이 남아있는 로마극장으론 유럽에 하나뿐이라고 뻐긴다. 이곳에 7, 8월에 오면 고대, 중세 유적 가운데서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을 듯하다.

▲오랑지의 고대극장 무대. 중앙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상이 서 있다.

▲정명훈 마에스트로의 포스터.
그다음부터는 중세부터 고대 로마의 유적 가운데서 거주하는 산 정상의 마을들을 가이드북에 따라서 순례한다. 포도밭을 가꾸며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산으로 올라가 마을을 이루고 살아온 사람들. 산동네에서 아랫동네 포도밭으로 출퇴근한 그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더듬어 본다. 매일 등산해야 하는 일상, 따로 운동하며 체력 단련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다.
오늘 가이드북이 인도한 마을들은 관광객들이 붐비지 않고, 날씨도 청량 쾌적해서 신선했다.

▲산 위의 마을 크레스테(Creste)의 카페.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전망에 비하면 아이스크림과 커피가 7유로이니 저렴하다. 손님도 우리뿐이다.
산이 없나, 바다가 없나, 농토가 없나. 너무 좋은 영토를 차지한 프랑스! 오늘도 배가 아프다.

▲포도밭 위의 마을 세귀레(seguret)에서 들러본 카페의 전망. 프로방스에서 가장 이쁜 마을 중 하나로 꼽힌다.
아비뇽, 내가 거주한 곳
풀어놓으면 초라한 우리들의 괴나리봇짐이 있는 곳, 테제베 역전에 위치한 현대식 호텔에 처음 입주할 땐 너무 정취 없고 기능과 편리함만 있어서 실망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곳에 진출할 때마다 지정석 있는 주차장과 교통의 편리를 즐겨왔고, Airbnb와 달리 호텔이라 내 수고 없이 싹 청소해주는 것도 좋아지고, 보안이 철저해서 도둑 걱정도 없다고 느껴지니 이 숙소에도 정이 든다.
지난해 여름, 토스카나의 숨 멎도록 아름다운 숙소 airbnb에서 한 달을 묵으며 두 번이나 도둑을 맞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동안 사 모은 물건들로 채워지고 있는 숙소.
지난 며칠 팍팍한 스케줄로 소모된 체력관리도 해야겠고, 오늘은 간만에 쾌적한 기온을 찍는 우리 동네 아비뇽에서 노는 날로 정한다. 성 밖에 있는 숙소에서 살다가, 이곳에 온 이후로 3번째로 아비뇽 고성에 입성하니 낯선 곳에 들어서는 긴장감 없이 마음이 아주 편하다.
어린 날 어른들이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문안 사람들이라고 부르던 기억이 떠오른다. 지금도 나는 서울에 가면, 사대문 안에 들어가야 서울에 온 느낌이 든다.
옛날 사람인 나에게 서울은, 조선시대의 사대문 안에 속하는 성안으로 들어가야 서울이듯, 내가 거주하는 성 밖의 아비뇽은 숙소일 뿐, 관광하러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온 '아비뇽'이 아니다. 아비뇽의 문안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고성 안에는 주차장이 있는 숙소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했다. 심지어 에어컨이 없는 숙소도 아주 많다.
아비뇽 고성 안의 주인공인 교황의 궁전을 관람하고.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중간에 잘린 채 남아있는 아비뇽 다리에도 올라가 본다. 론강 가운데 자리한 공원으로 조성된 중지도 같은 섬에 데려다주는 배로 아비뇽 다리를 바라보며 론강도 건너본다.

▲교황청의 위용.
오늘도 이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해주는 건, 미스트랄(Mistral)이라고 불리는 바람과 햇살과 쾌적한 공기라고 느껴진다. 역사와 유적과 문화가 아무리 찬란해도 자연 앞에선 다 액세서리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비뇽에 온 첫날 내가 처음 만난 것도 교황청의 영광보다 이곳의 바람이었다는 기억이 바람결에 스며든다.
그러나 미스트랄(Mistral)이 강력한 풍속(시속 90km)으로 그 위세를 떨치면 이런 말 못하고 숙소에 갇혀있어야 하겠지. 주로 겨울에서 봄까지 무섭게 불어대는 북서풍 미스트랄이 이 지방에 머물던 빈센트 반 고흐를 미쳐버리게 했나 보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그 바람을 느껴보러 이곳에 와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맑고 청명한 날씨에도 마구 불어 재낀다는 바람이, 오늘은 쾌적하고 나긋하게, 프로방스의 주인공인 자신의 존재감을 여행객에게 속삭인다.

▲전성기 영광의 시절 교황청 내부의 모습.

▲교황청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아비뇽.
정치적인 이유로 이곳에 약 70년간 옮겨와 있던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간 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던 아비뇽 교황청은 20세기 초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선 요새 2, 30년만 지나면 재건축하는데, 천년 세월 남아있을 굉장한 건축을 하는 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내 눈앞에 서 있는 천년 세월의 유적을 돌아보며 감동과 함께 스며드는 무엄한 질문이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세상에선 아예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다. 누군가의 피와 땀을 발라야 가능한 건축물들이 천년 세월을 이고 지고 남아서, 분명히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 없는 지난 시간을 형상화하고 서 있다. 보이지 않으나 시퍼렇게 존재하는 시간은 참으로 신비한 개념이다.
교황 시대에 세워진 아비뇽 다리는 다리 중간에 채플이 있고 다리 중간이 끊어져 남아있는 유적이다. 한국의 어린이들도 아는 프랑스 동요 '아비뇽의 다리 위에서'(Sur le pont d'Avignon)로 유명세가 대단하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다고 느껴진다.
특히 배 타고 건너가서 바람 부는 강가에서 바라본 모습이 압권이다. 홍수로 계속 무너져서 복원을 포기하고 내버려 둔 끊어진 다리가 유네스코 지정 유적지가 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방문자들에게 시간 여행을 선사하고 있다.
부속 박물관에서 과학자, 고고학자들의 탐구로 원래 다리 모습도 복원하여 3D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며 궁금한 것들을 파헤치는 일로 밥 먹고 사는 과학자들이 있어서 호기심을 채워주니 다행이다.

▲론강 위에 중간이 끊긴 채로 남아있는 다리.
스케줄에 연연함 없이 여유롭게 우리 동네에서 놀고 오랜만에 초저녁에 귀가해서 어제 사 온 와인과 귀갓길에 사 온 바게트(집으로 걸어오며 거의 다 먹어버림), 지나가다가 농가에서 사 온 잘생긴 이탈리아 가지를 루시용 가게에서 테이블보 사니 덤으로 준 올리브오일과 발사믹에(덤으로 주는 정취, 너무 오래간만인데 여기선 종종 그래서 뭉클했다) 묻혀 펜에 굽고 모차렐라 치즈랑 같이 먹으며 여유로운 저녁을 갖는다.
와인은 마셔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7유로에 한 병만 재미 삼아 사 왔는데. 맛이 너무 훌륭하다. 요즘 내가 좋은 와인의 맛을 살짝 알아가고 있는 듯한데 우리 동네에서 20~30불 정도 될 것 같은 수준이다.
내일은 새벽밥 먹고 테제베 역으로 걸어가서 고속철로 말세이유로 진출해볼 예정이라 오늘은 일찍 퇴근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