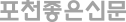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필자 김은성 작가.
Day-10, 명품 아울렛 the Mall Firenze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전날 밤 천둥소리가 들렸을 뿐 하늘이 파랗다. 왕복 13유로 티켓으로 호사스러운 이층버스가 피렌체 관광의 꽃 중의 하나인 명품 아울렛에 데려다준다. 아름다운 토스카나 구릉들 사이에 아울렛이 현대식 건물로 멋있게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모든 매장을 갤러리 보듯 둘러본다. 미국의 아울렛 쇼핑몰에선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은 식당에서 고급스럽고 맛있는 점심도 사 먹으며 한참을 쉬다가 계속 구경했다. 그러나 총 5시간 동안 관람(?)했는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물건을 못 만나서 빈손으로 왔다. 미국에 비해서 심하게 싼 가격이어서 유명 디자이너 작품 한 개라도 건져야 하는데, 별로 필요할 것이 없는 나이가 되어 버렸다.

▲토스카나의 구릉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현대식 아울렛 몰.
Day-11, 피렌체의 중앙시장
오늘은 피렌체 관광 중요 리스트로 꼽히는 중앙시장(Mercato Centrale Firenze)으로 간다. 가죽 제품 파는 길거리 수레에서 한국말로, "언니, 아줌마 싸게 줄게"라면서 호객행위를 한다. 수레에 있는 물건을 만져라도 보면 뒤편 가게로 모셔(?) 가서 가게 물건을 다 팔아치울 기세로 별의별 것을 사라고 권한다. 가죽 가공으로 유명한 피렌체라서 있을법한 예사롭지 않은 녹두 색 가죽 장갑 한 켤레만 사고 겨우 빠져나왔다.
식품을 주로 파는 중앙시장에서 이것저것 먹음직한 거로 집어 들고 집으로 와서 휴식 겸 점심을 먹으니 아늑하다. (2021년 현재는, 피렌체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경기도 판교에도 이 중앙시장을 모델로 더 호사스럽게 지은 시장, 이탈리아 식자재들을 파는 곳 Eataly가 있다고 한다)

▲토스타나 전통 요리 중 하나인 멧돼지 고기 파는 정육점의 멧돼지 인형.
오후엔 미켈란젤로의 광장으로 오르는 비탈길을 거의 등반해서 올라간다. 19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이던 피렌체가 도시정화 사업으로 조성한 언덕 위의 광장이다. 피렌체가 낳은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기념하며 대리석이 아닌 브론즈로 만든 다비드상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이곳은, 피렌체 최고의 전망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붉은 지붕들이 펼쳐있는 피렌체 구도시의 모습이, 르네상스 시절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보티첼리, 그리고 메디치 사람들의 망막에 비치던 모습과 거의 같다는 사실은 항상 숨이 멎을듯한 감동을 안긴다. 피렌체인들이 그동안 이 도시를 가꾸고 보존해준 노력으로, 이곳에 멈추어 있는듯한 시간을 깊이 음미해 본다.

▲광장에서 내려다보이는 피렌체 구도시는 르네상스 시대 500년 전과 같은 비주얼이다.
광장보다 좀 더 높은 언덕엔 1천 년 전인 1,018년에 지은 산미니아토(San Miniato)성당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전망이 더 좋다고 가이드북에 쓰여 있어서 그다지 유명하진 않은 그곳까지 더 올라가 본다.
본당엔 3세기에 순교한 미니아토 성자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고, 뒷마당엔 피노키오의 작가(Carlo Lorenzini)를 비롯한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묻혀있는 묘지도 있다.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무덤이다. 아름다운 전망을 품고 천년의 시간이 담겨있는 성당은 언제보아도 신비롭다.

▲마니아토 성당.
이탈리아 성당 중 최고의 전망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여기서 내려다보는 피렌체와 아르노강의 모습이 예술 같다. 예술이 보이지 않는 감성이나 영성이나 철학 등을 형상화, 음악화, 문자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남겨둔 피렌체도 도시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된다.
올라온 김에 야경도 보려고 미켈란젤로 광장을 내려다보는 레스토랑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피렌체의 야경까지 눈에 담고 귀가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피렌체를 내려다보는 광장. 오른쪽의 오래된 건물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 건물은 1869년 광장을 조성할 때 박물관으로 지어진 신고전주의 건축물이다.
Day-12, 메디치의 채플 Cappelle Medicee
여행 떠나기 전 미리 확인해 본 일기예보에 의하면 피렌체는 거의 매일 비 소식이었다. 처음 나서는 겨울 여행에 궂은 날씨가 이어질까 봐 큰 걱정을 했는데, 막상 오늘 오후부터 비가 줄줄 내리니 오히려 체감온도가 포근하다. 우산 받고 골목길 걷는데 그다지 한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겼다.
기차역 앞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광장에 다시 가보니, 심히 아름다운 성당에만 눈길을 주느라 자세히 못 봤던 건너편 현대미술관 건물 디자인이 낯익었다. 설명 표지판을 읽어보니 브루넬레스키가 디자인한 보육원 건물을 바로 베껴서 동시대에 지은 건물이었다.
아치 기둥 사이에 파란 테라코타까지 같은데, 테라코타의 주제가 보육원엔 아기들, 여긴 성경의 이야기라는 차이만 있다. 르네상스 시절 순례객들의 쉼터로 쓰이던 건물인데, 오늘날은 미술관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베끼는 재생산은 시대 불문이다.

▲브르넬레스키의 보육원 건물과 똑같이 생긴 현대미술관.
오늘 관광의 정점인 산로렌조(San Lorenzo )성당은 메디치 가문의 가족묘지라고 보면 된다. 입장료 8유로 받는데, 공짜로 보여주는 곳들도 훌륭하지만, 입장료 받는 곳도 그 돈이 절대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해준다.

▲다양한 색의 천연 대리석들을 오리고 붙이고 다듬고 깎아서 만든 벽과 바닥. 메디치 사람들은 벽에 올려서 붙인 석관들에 누워서 방문객들을 맞는다.
메디치 가문의 부를 이룩한 코지모 1세가 짓기 시작하여, 그 어마어마한 소장 예술품들을 피렌체시에 기증하고 가문의 역사를 끝낸 안나마리아 루이자까지 6세대 200여 년에 걸쳐 지어져 온 가족묘지다. 모든 예술품은 피렌체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기증 조건 덕에, 오늘도 피렌체는 르네상스 시대를 담은 보물함 같은 도시로 남아있다.
메디치의 통치 역사가 가문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로만 평가되었다면 메디치의 명성이 깊은 자국을 남기지 않았겠으나, 주민들에게 플로렌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민중들이 힘을 갖는 공화정을 안착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술을 육성한 공로로 평가받는 것 같다.
성인들의 유물이나 뼛조각 등을 간직한 relic, 성물함에 대한 집착도 대단하여 Pitti 궁전에는 성물함을 잔뜩 모아놓은 채플이 있었다고 하고, 그중 많은 성물이 이곳에 전시되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의 조각을 보관하는 성물함.
메디치 성당의 바실리카(무덤이 있는 채플)는 화려한 색의 대리석들을 깎고 다듬고 오리고 붙이는, 엄청난 노동과 기술이 필요한 정교함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은, 무려 미켈란젤로에게 주문하여 제작한 대리석 조각들이 장식하는 '예술작품'으로 미술사학자들의 연구대상이며 미술 애호가들의 감상 대상이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만든 석관에 잠든 메디치 가문의 통치자 피에로. 가운데 로마 군인의 옷을 입은 사람이 무덤의 주인공이고, 왼쪽은 황혼, 오른쪽은 새벽을 의인화한 조각작품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의상이 아닌 로마인의 의상을 입은 모습으로 주인공을 표현한 점이 흥미롭다.
비 내리는 거리에서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가니 수백 년 된 식당의 내부가 유난히 아늑하게 느껴지고, 송로버섯(truffle) 향기와 키안티 포도주, 카푸치노와 티라미슈 등이 미각을 아주 즐겁게 한다. 차고 건조한 토스카나 빵들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 집은 금방 구운 따스한 빵을 줘서 마구마구 먹었다. 최소한 하루 1만 보를 걸으니까 하면서. 시차 적응으로 고생도 계속하는 중이니 아주 많이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생존본능이 식욕을 화들짝 깨워 일으킨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식당 내부.
오후엔 피렌체 골목들을 쏘다니며, 오래된 성 같은 건물에 갤러리같이 꾸며진 구찌, 페라가모 등 피렌체 출신 디자이너들의 매장들과 작은 구멍가게들을 구경하다가 아늑한 고택으로 귀가한다.

▲피렌체의 상징물들로 디자인된 페라가모의 스카프는 사 올 걸 그랬다.
Day-13, 피렌체에서 '집콕'
오늘은 여기 머무는 동안 기온이 제일 낮은 날씨에, 눈비가 내린다. 그동안 밤잠 설치며 쏘다닌 피로가 덮치는 느낌이 들어서 문밖에 나가지 않고 쉬었다. 여기와서 처음으로 졸린다는 게 반가워서 몸이 시키는 대로 낮잠도 자고 뒹굴뒹굴하니 몸이 아주 편해진다.
Day-14, 플로렌스의 마지막 하루 Last day in Florence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쓰니 간호계의 대선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영국의 귀족이지만,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플로렌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던 시절, 영국사람들이 맘대로 바꿔서 부르던 지명이 영어권 나라들에 알려진바, 이탈리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혼란을 야기해 버린 영국의 민폐(?)도 생각해본다.
아주 많은 사람이, 피렌체가 바로 플로렌스인지 모른다고 한다. 고려를 Corea라고 부른 건 발음상 비슷하지만, 피렌체와 플로렌스는 비슷하지도 않으니 무리가 아니다.
오늘은 여기 머무는 동안 가장 포근한 날씨다. 마지막 날 추워서 웅크리고 다녔으면 힘들다고 생각되어서 여행이 끝나가는 것이 덜 섭섭했을 텐데, 르네상스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피렌체 골목을 샅샅이 쏘다니며 아름다운 건물들과 가게들의 인테리어 등에 감탄하며 포근한 산책길이 이어지니, 오늘이 마지막인 게 아주 섭섭하다. 피렌체 구도시만으로도 감동이라 주변의 도시탐방 없이 2주간 여기서만 있다가 가니 정이 폭 들어버렸다.

▲매일 이 앞을 지나면서, 보고 또 보고 감동한 아름다운 두오모, 아리베데치(다시 만나자).
오늘 아침, 단군이래 제일 부유한 현재 대한민국의 메디치라고 불리는 삼성가의 장녀 이인희 씨의 부고를 읽었다. 졸업 후 지금의 강북 삼성병원에서 잠시 근무할 당시 병원에서 그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새내기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이런저런 걸 묻던 기억이 있다.
점잖고 잘생기셨던 병원 원장님의 사모님이었는데 기사를 보니 바로 그 당시부터 경영 일선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 의욕 충만으로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싶었던 듯하다. 여장부 같은 인상이었는데, 평생의 자랑이 자신이 세운 오크밸리의 미술관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삼성가도 메디치처럼 대한민국 예술을 오래 빛나게 해줄 공헌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까?
이번 여행은 유난히 시차 적응이 힘들어서 낮엔 행복하다가 밤이 되면 객지에서 아플까 봐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어제 하루 잘 쉬고 회복되니 힘든 건 다 잊게 된다. 아프지 않고 매일 15,000보를 기본으로 걸어주면서 시간여행을 즐기다가 내일은 집으로 간다. 집에 가도 고국을 떠나와 사는 타향이긴 마찬가지이지만 Home, sweet home으로.
많이도 회자하는 단어이지만 막상 아는 것은 없다고 느껴진 르네상스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배움의 기쁨을 이번 여행에서 꾸려가지고 간다. 2주 동안 종일 한 과목만 공부하고 3학점을 이수했던 대학원의 겨울학기같이 느껴지는 여행을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기말고사가 없으니 더 좋다.
편집자 주, 작가 김은성의 '피렌체에서 만난 르네상스 편'은 여기서 끝을 내고, 다음 회부터는 또 다른 여행기로 독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