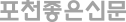▲필자 석인호 작가.
날씨 풀리자 까치들의 합창소리 요란해
동네 공원에서 까치들이 일제히 날며 요란하게 울어댄다. 더러는 둥지를 떠나 다른 나뭇가지에서 울고 어떤 녀석은 땅바닥까지 내려와 논다. 추운 겨우내 한 마리도 안 보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까치들이다. 여러 놈들이 함께 날거나 시끄럽게 울어대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린다. 그들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는 모르겠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던 날씨가 불과 며칠 새 영상으로 변했다. 급기야 오늘 아침의 최저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올랐다. 갑자기 봄을 향해 한 달가량 건너뛴 듯하다. 나도 털모자와 장갑을 집에 두고 얇은 차림으로 아침 운동에 나섰다.


자주 가서 걷고 달리던 동네공원은 수목이 울창하다. 그중 공원의 외곽을 따라 늘어선 메타세쿼이아들이 일품이다. 위로 높고 곧게 자라 바로 옆 20층 아파트들과 키재기를 할 정도다. 공원 트랙에 표시된 숫자를 보면 한 바퀴 거리는 대략 1,150m쯤 될 것 같다.
오늘 아침 공원에 나가니 평소엔 못 들었던 까치 소리가 요란했다. 한 주의 첫날 아침에 듣는 까치 소리에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예부터 아침에 까치 소리 들으면 반가운 손님이나 소식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까치들이 한 두 마리가 아니었다. 삼삼오오 모여 날거나 이 나무 저 나무의 가지들에도 몇 마리가 더 앉아 있었다.


까치들도 따스해진 봄 날씨가 좋아 기지개도 켜고 날갯짓도 하며 좋아서 기뻐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까치둥지들을 자세히 세어봤다. 모두 15개였다. 그 까치둥지들은 모두 나무의 꼭대기 가까운 높은 곳에 있었다. 대부분 한 나무에 하나 또는 두 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 여섯 개는 바로 옆에 선 두 나무에 세 개씩 세로로 달려 있었다. 까치들도 사람들처럼 여럿이 마을을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는 듯했다. 여섯 둥지가 있는 곳에선 까치 한 마리가 가운데쯤 위치의 가지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마을의 경계를 서는가 보다.


이와는 달리 까치들의 마을에서 좀 떨어진 키 낮은 느티나무엔 대여섯 마리의 비둘기들이 앉아 있었다. 비둘기들은 집도 없이 가지에서 늦잠을 즐기고 있었다.
안전을 위해 높은 곳에다 나뭇가지들을 모아 지은 튼튼한 집에서 추위도 피하며 사는 것이 까치들의 생존법인가 보다. 그들의 지혜가 경이롭다. 사람들이 하찮은 미물로 여기는 까치들의 지혜보다도 뒤떨어진 정치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더 걱정된다.